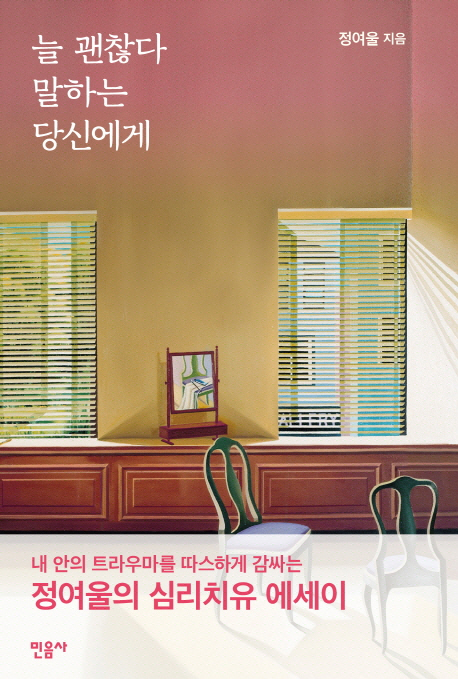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다 보면 얄밉지만 공감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를 만나곤 한다. 문학평론가로 출발해 이 시대의 가장 정열적이고 대중적인 글쟁이가 된 정여울(40)에게 제인 오스틴의 소설 ‘이성과 감성’의 둘째 딸 매리앤이 꼭 그랬다. 집안 형편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언니의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꿈만 좇는,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매리앤은 늘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아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심리학의 관점으로 본 매리앤은 차마 세상에 꺼내 보일 수 없었던 또 다른 자아 ‘알터에고’였다고 한다. 살아남기 위해 연기해온 사회적 자아(페르소나)는 언니를 지지했지만 이면의 숨은 그림자는 매리앤을 욕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면에 웅크리고 있던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극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심리학을 공부했던 정 작가가 전공인 문학과 심리학의 만남을 주선한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민음사 펴냄)를 내놨다. ‘문학의 프리즘에 비춰 본 심리학’을 지향하는 이 책은 정 작가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는 데서 시작해 비슷한 상처를 나눠 가진 소설 속 인물을 비추고 심리 분석의 틀을 통해 치유의 길을 모색한다. ‘나’에서 시작된 고민은 ‘우리’의 치유로 마무리 된다는 것이 책의 특징이다. ‘나의 상처’에만 집중하는 대신 현대인의 집단적 우울을 해소하고 사회를 치유하려는 정 작가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4일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만난 정 작가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자기검열의 시대에선 우리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며 “문학과 심리학을 통해 나의 우울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독자들 역시 문학과 심리학의 힘을 빌려 아픔의 뿌리를 꺼내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책을 냈다”며 집필 의도를 설명했다. 15년간 심리학을 독학했지만 이를 주제로 책을 내기까지 정여울 스스로도 자신감을 키울 시간이 필요했다. “전공자들 눈으로 보면 ‘네가 무슨 심리학자냐’고 비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제 전공인 문학의 힘을 빌렸어요. 문학 작품 속에서 나를 매혹시킨 주인공들은 어딘가 나와 닮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었거든요. 문학을 통해 나만 그렇지 않다는 위안을 얻었고 그들의 일을 내 일처럼 고민하면서 치유해 나간 거죠.”
“문학은 ‘내가 가지 못한 길’을 마음속으로나마 휘청거리며 걸어보게 만드는 아름다운 상상의 오솔길”이라는 책 속 표현대로 이 책은 정 작가가 프로이트, 아들러, 구스타프 융 등 대표적인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기대며 직접 걸어본 여정의 기록이자 독자와 함께 걷기를 청하는 초대장이다. 정 작가가 소개하는 소설 속 인물들은 다양한 트라우마의 유형을 보여준다. ‘연인’의 백인 소녀를 통해 자신과의 관계 맺기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모든 관계 맺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진기행’의 윤희중을 통해 모든 거짓된 페르소나를 벗고 진정한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는 법을 보여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릿을 통해선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어기제는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일시적인 위안 말고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앞서 밝혔듯 정 작가의 심리 치유는 개인의 내면으로만 향하지 않는다. ‘책 읽어주는 남자’의 미하엘과 한나가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고 어루만지는 과정을 짚으며 한 사회가 짊어진 ‘집단적 죄책감’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고민하기도 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는 정 작가는 에세이가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나를 우리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심리학과 문학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꺼내든 정 작가가 다음으로 향할 행선지는 페미니즘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 될 학문은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해요. 적을 만드는 페미니즘 대신 문턱을 낮춘 페미니즘, 남성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페미니즘은 어떤 것일지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은 좀 더 준비가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페미니즘의 길을 모색해야 사회적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 사진=이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