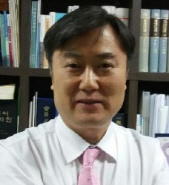일본의 침공으로 시작된 조선과 명, 일본의 3국전쟁은 16세기 말 끝이 난다. 그런데 이 세 나라는 17세기 들어 전후수습의 틈도 없이 또 다시 전란에 휩싸였다. 일본에서는 내전이 일어나 토요토미 가문이 도쿠가와 가문에 몰살당하고, 중국에서는 만주족이 한족왕조를 없애고 새 왕조를 세운다. 그 와중에 조선은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고 회생불능의 왕조 편에 섰다가 청군의 침공을 불러 국토가 유린되지만, 이웃나라와 달리 왕조의 교체는 없었다.
이러한 국제정세로 17세기 후반 세 나라는 전후의 민심수습과 함께 영토문제에 봉착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조선의 조정은 영토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라야 어떻든 신분적 특권유지에 골몰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남쪽 해안과 북쪽 국경지대의 백성들은 외인과의 충돌로 생계의 위협을 받기 일쑤였다.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한 백성들이 영토문제에 발 벗고 나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부산포의 사나이 안용복이다. 하지만 노비라서 교육을 받지 못한 그가 처음부터 영토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단지 부산포에서 자라면서 집 가까운 왜관을 드나들다보니 왜국사정이나 왜어를 잘 알게 된데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미라 사건에 휘말렸을 따름이다.
경상좌수영에서 수군 복무를 마친 안용복은 1693년 동료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갔다가 울릉도 해역에서 떼로 조업 중인 왜선을 목격했다. 이에 분개한 그는 동료 박어둔과 함께 왜선에 건너가 “왜 남의 나라에서 고기잡이를 하느냐”고 따지다 일본으로 납치돼 관아로 끌려갔다. 그럼에도 그는 전혀 기죽지 않고 일본의 지방관에게 “울릉도나 독도는 조선에서 하루길이지만 일본은 닷새길이니 분명히 조선 땅이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그러자 그 지방관은 중앙관서(막부)에 해결책을 물었는데, 막부에서는 “지리적으로 울릉도가 조선의 땅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서류와 함께 안용복을 조선으로 송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안용복은 대마도를 통해 부산포로 송환됐다. 그런데 이 때 조선과 일본의 무역을 독점해온 대마도주가 어로권과 무역독점권의 상실을 우려해 막부의 서류를 빼돌린 후 ‘막부에서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조문서를 조선에 보냈고, 이 때문에 안용복은 부산포를 관할하는 동래관아의 재판에서 큰 고초를 겪는다.
재판에서 안용복은 대마도주의 문서위조사실을 고했지만 관에서는 천한 뱃놈의 말이라 믿지 않고 곤장 100대와 2년 유배형을 내렸다. 이때 다행히 그 위조문서를 의심하는 관원이 있어 사형을 면했지만, 곤장 100대는 살아남더라도 불구를 면할 수 없는 중벌이었다. 그렇지만 곤장을 치는 나졸이 판결의 부당함을 알고 매질에 온정을 베푸는 바람에 그는 불구를 면했다.
그 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했다. 더욱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왜인의 어로가 여전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가 막혔다. 그래서 그는 유배가 끝나자마자 부산포와 염포(울산) 바닷가 백성(상인과 승려)의 도움으로 배와 관복을 마련한 뒤 장정들을 이끌고 관원인양 울릉도와 독도 앞바다를 단속했다. 그러다 1696년 봄 근본적인 해결을 작정하고 배를 타고 일본서부지방 해안가인 호키로 건너가기에 이른다.
일본에 온 안용복은 호키의 지방관아를 통해 대마도주가 조선조정과 일본막부 사이에 농간을 부려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고 무엄하게도 막부문서를 위조한 죄상을 알리는 고발장을 막부에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호키의 지방관이 이를 대마도주에게 귀띔하는 바람에 그 고발장이 막부로 가지 못하지만 대마도주가 막부의 진짜문서를 조선에 보내는 데 성공했다.
그 후 안용복은 동해를 건너 조선으로 귀환하자마자 강원감영에 자수를 했고, 강원감영은 국제분쟁이라는 이유로 그를 서울로 압송했다. 조정에서는 “비천한 어부가 법을 어기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죄는 일벌백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든지 사형 대신 곤장과 유배형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조선조정으로 하여금 영토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청과도 경계협상에 나서도록 했고, 이로 인해 10여년 후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다. 그런데 그 후 애국적인 부산포 사나이의 기록이 관의 권위로 모두 삭제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위대한 영웅의 말로를 알 길이 없다.
역사를 보면, 조선 관료의 무능과 탐욕에 말문이 막힌다. 그리고 이러한 무능과 탐욕은 선민의식과 백성을 하찮게 보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시급하다./문성근 법무법인 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