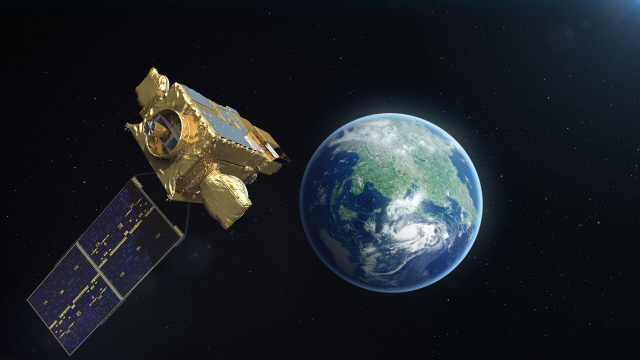178억4,700만원. 지난 2012년 우주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거둔 무역수지 흑자액이다. 절대금액 자체는 많지 않지만 우주산업 분야의 ‘순(純)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변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까지 수출과 흑자규모는 증가세를 타고 있다.
수출 증가의 주역은 인공위성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가 한국 우주산업 총수출의 98%(2016년도 기준 1조1,230억5,900만원)를 차지했다. 쉽게 말해 내비게이션과 위성방송 등과 같은 서비스 콘텐츠와 이를 수신하기 위한 셋톱박스 등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이다.
우주산업의 본류인 우주기기 제작 분야에서는 아직 무역역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1,106억원가량의 무역적자를 봤다. 발사체(로켓)와 위성체 등에서 아직 수입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우주기기 분야에서도 무역 흑자의 희망이 움트고 있다. 희망의 징조는 크게 세 가지다. 기술 자립도의 비약적 향상, ‘규모의 경제’ 기반 마련, 틈새시장 공략이다.
실제로 한국형우주발사체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누리호’는 100% 우리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다. 위성 분야에서도 설계기술은 상당 부분 자립했다. 위성부품 역시 60%대의 국산화율(다목적 실용위성 기준)을 이뤄냈다. 방위산업계의 한 간부는 “미국조차도 경제성을 감안해 우주기기에 쓸 범용부품이나 소모성 부품은 일부 수입하되 핵심분야 위주로 국산화의 기반을 넓혀왔다”며 “우리도 핵심부품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자립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기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주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최소한 매년 한 번씩은 우주개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1~2번씩은 위성 등을 쏘아 올리도록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소개했다.
물론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위성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전 세계 우주산업의 규모는 2016년 기준 3,391억달러(약 380조억원)에 달한다. 이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상당 부분 선점한 상태다. 한국은 이들과 정면 승부를 하는 대신 틈새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바로 중형 및 준대형 위성 분야다. 이 분야는 선진국이 아직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는 분야다. 준대형 위성은 가성비가 좋아 대형 위성을 사기에는 부담을 갖는 신흥국들을 공략하기에 좋다.
준대형 위성 분야에서 한국은 딱 좋은 플랫폼을 개발해놓았다. ‘천리안 위성’ 시리즈다. 천리안은 공식적으로는 대형 위성을 표방하지만 실제 중량은 3.5톤이다. 보통 4~5톤 수준인 선진국들의 대형 위성보다 체급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다. 승용차 체급에 비유하자면 ‘에쿠스’와 ‘쏘나타’ 사이의 인기차종인 ‘그랜저’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중형 위성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이 뿌리를 내렸다. 7호기까지 성공적으로 발사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시리즈를 운용 중이다. 후속의 차세대 중형 위성도 이르면 내년 중 개발이 완료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 위성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중형 위성”이라며 “우리나라는 이 분야의 위성체 제작에 있어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제작해 수출하는 준대형 및 중형 위성의 발사 위탁까지 받게 되면 수익성 면에서 금상첨화가 된다. 한국은 전남 고흥에 나로우주센터라는 발사장을 갖추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위성을 탑재할 국산로켓을 완성하지 못했다. 다만 1.5톤의 탑재체를 실을 수 있는 누리호가 오는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되면 최소한 중·소형 위성은 한국이 직접 띄울 수 있게 된다. 준대형 위성도 향후 20여년 내에는 국내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늦어도 2040년까지는 3~4톤 이상의 탑재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로켓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우주산업은 2040년 최대 1조7,500억달러(약 1,96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