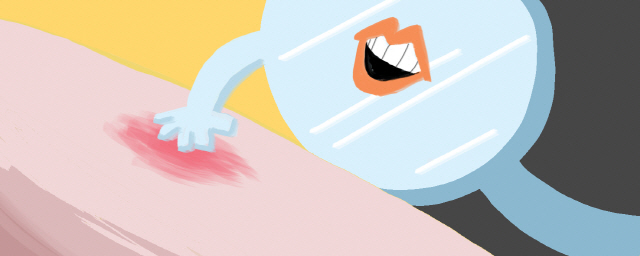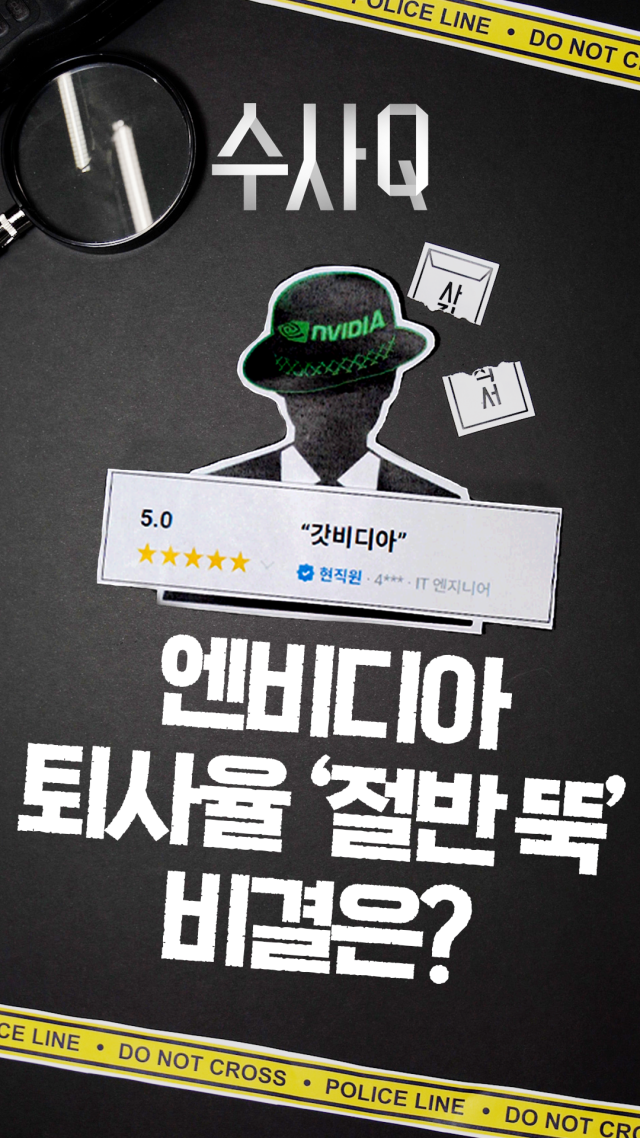얼마 전 나는 가벼운 화상을 입어 급히 병원에 갔다. 상처 부위는 크지 않았지만 고통이 심해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의사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이거 골치 아플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병원에선 이런 상처는 취급하지 않아서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화상부위를 만져보기까지 하고, 환자가 아파하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막연히 ‘뭔가 골치 아파질 상황’을 상상하며 ‘나는 당신을 환자로 받아줄 수 없다’고 선언하는 의사의 반응이 당혹스러웠다. 혹시 흉터가 생기면 의료분쟁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다른 병원에 가보세요. 길 건너편 피부과로 가시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의사가 추천하는 그 ‘길 건너편 피부과’도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일반적인 상처’는 진료하지 않고, ‘피부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라고 한다. 왜 피부과에서 피부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돈이 되는 피부관리’만을 취급하는 것일까. 어떤 병원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길까봐’ 환자를 받지 않고, 어떤 병원은 ‘돈이 되지 않으니까’ 환자를 받지 않는다.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어떤 환자든 차별없이 받아주는 피부과를 찾았다. 백발이 성성한 의사선생님은 내 상처를 보시더니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다. “지금은 많이 아프겠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주사 맞고
가.”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다. 심한 결막염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너무 아프시니까 잠깐 봐드리기는 하겠지만, 여기는 라식이나 라섹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에요. 앞으로는 다른 병원에 가 보세요.” 눈이 아파 흘리던 눈물이 모멸감의 눈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의 상처는 돈이 되지 않으니, 취급하고 싶지 않다’는 의중을 전하고 있었고, 그 순간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며 격렬한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요새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 “실손보험 있으세요?” 실손보험이 되면 비싼 영양주사도 놓을 수 있고, 추가적인 검사도 마음껏 진행할 수 있으니,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각종 주사와 각종 처방이 추가된다. 나도 몇 번 당한 적이 있다. 시간이 없는데도 굳이 값비싼 영양주사를 맞으라며, 매우 효과가 좋은 성분이라며 의사가 강권을 했다. 몸이 아플 때는 마음도 약해지는 법이라, ‘그래, 지금은 아프니까 의사선생님 말씀을 듣자’라는 생각으로 주사를 맞았지만, 일반투약에 비해 큰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다보니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회사에 갈 시간이 없어 더욱 난처했다.
환자는 의사 앞에서 한없이 약해진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낫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최고의 은인처럼 보이게 마련이다. 환자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단지 정확한 처방만이 아니라,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의술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말 한 마디’가 환자에게는 최고의 치료제가 될 때도 있다. 환자들은 ‘돈 되는 환자’와 ‘돈 안 되는 환자’를 확실히 나누는 의사들의 차가운 눈빛에 상처 받는다. 환자를 배려하지 않고 의술을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의사들의 냉정한 말투 때문에 환자들은 병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마음의 병을 또 하나 얻어온다. 의사가 지닌 최고의 무기는 의료기술만이 아니다. ‘어디가 아프시냐’는 평범한 인사, 병의 경과에 대한 친절한 설명, ‘많이 걱정하시지 마세요’ 같은 따스한 위로의 말들이다. 얼마 전 미국의 메디컬드라마 ‘뉴암스테르담’ 시리즈를 보면서 나는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저런 의사들에게 진찰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드라마 속의 의사들은 뉴욕에서 가장 큰 공립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의 명성을 높여주는 텔레비전 출연이나 ‘VIP환자’가 아니라 바로 ‘아픈 환자들’의 몸과 마음에 순수하게 집중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의료팀장 맥스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대사는 바로 이것이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What can I do for you?)” 그는 ‘시스템이 너무 커서 바꾸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자고 말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바뀌면 시스템도 바뀐다.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할 힘을 지닌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아름다운 특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특권을, 오늘도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