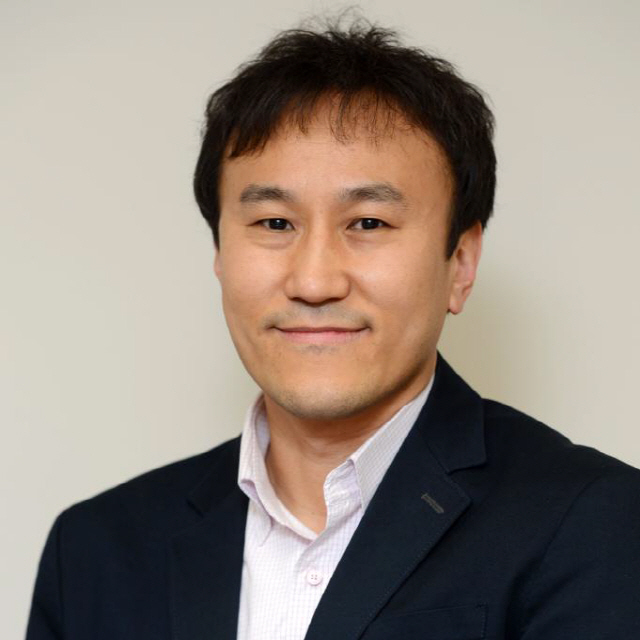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 2017년 1월. 본지는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갖춰야 할 리더십을 제언하는 특별 인터뷰 시리즈를 진행했다. 당시 기자는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을 만났다. 남 전 장관은 언론인·정치인·관료로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답게 직설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리더십으로 진보·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협치(協治)’를 꼽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사례로 제시했다. 루스벨트는 야당을 설득한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아이젠하워는 탁월한 균형감각으로 진보와 보수로부터 모두 존경을 받았다.
지난주 문재인 정부 3년 차가 시작됐다. 당시 남 전 장관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가 우려했지만 결국 지난 2년간 협치는 완전히 사라졌다. 서로 네 탓만 하던 여야 4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완전히 둘로 갈렸다. 협치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정국의 주도권을 쥔 청와대와 여당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2년 동안 적폐 청산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 실험에 매달렸다.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경주마처럼 눈과 귀를 꽉 막고 앞만 보며 달렸다.
협치의 상대방인 야당도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옷을 갈아입은 제1야당은 아직도 진영 논리에 매달리며 지지층 결집에만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도를 넘은 발언은 중도성향 보수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년간 협치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여야 어느 한쪽으로만 미루기 힘든 이유다.
정당의 제1 목표가 정권 획득과 선거 승리라고는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행보는 대중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기에 충분하다. 정당 정치의 기본을 저버리고 당리당략에만 치중하고 있다. 부담은 전부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여야의 갈등으로 국회는 이미 식물국회가 됐다. 대내외 악재로 경제는 고꾸라지고 있는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들은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문 대통령이 14일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주문했지만 서로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미지수다. 여야는 이미 내년 4월 총선으로 눈을 돌렸다. 총선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상생이나 협치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낼 방법은 없을까. 협치를 통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로 성장한 스웨덴의 성공 사례를 보자. 스웨덴은 1930년대만 해도 빈부 격차에 노사 대립, 진보와 보수 정당의 다툼으로 의회는 싸움터였고 정부는 1·2년 주기로 교체를 반복했다. 당시 총리이던 사회민주당 소속의 페르 알빈 한손은 탁월한 리더십과 정치력으로 좌우 연정과 노사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변화 요구를 실행에 옮기려면 결국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적 타협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그 역할은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식의 표정’, 전병근 저)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가 같아도 과정과 수단이 다른 정당 사이에 협치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국의 주도권을 쥔 대통령과 여당부터 실타래를 풀어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한 협치는 곧 덧셈의 정치다. 갈등과 분열의 뺄셈 정치가 아닌 국가와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다. 협치는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여야가 단순한 더하기의 덧셈의 정치를 넘어 시너지를 내는 곱셈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곱셈의 정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국 정치와 경제를 살리는 해법은 곱셈의 정치뿐이다. /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