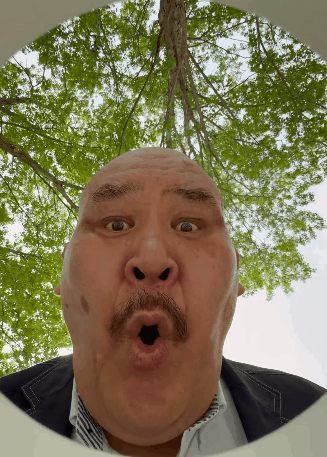- 장철문
다시 올까? 썩은 가지는 떨어져 부서지고,
목이 없는 해바라기 대궁
지퍼를 목까지 끌어올리고
발아래
부서지는 서릿발
장다리 꽃필까? 얼음 박인 봄동
밤나무 가지에 비닐 걸려 날리고,
다시 싹틀까?
저수지
살얼음 위에 날리는 눈발
물오를까? 뒹구는 새의 부러진 뼈
머리는 부리를 달고
육탈을 기다려
다시 날아오를까, 연두는
우화(羽化)처럼
염려 마슈. 곧 부지깽이도 싹이 날 거유, 불탄 줄도 모르고. 바위도 엉덩이 들썩거린다니까, 제가 감잔 줄 알고. 흥부네 장남은 겨우내 주리고도 소리치잖수. ‘애고 어무니! 나는 올봄부터 불두덩이 간질간질 가려우니 장가 좀 보내주우.’ 세상에서 가장 품 너른 종교가 봄교 아니우. 이념의 철조망 너머에도, 이교도의 땅에도 봄은 온다우. 경전도 없고 사제도 없으니, 연두에는 오독과 시비가 없다우. 긴 겨울 동안 어디서 무얼 했는지 묻지도 않고,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손을 잡아 준다우. 온갖 못난 것들조차 눈 틔워 주고, 꽃 피워 준다우. <시인 반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