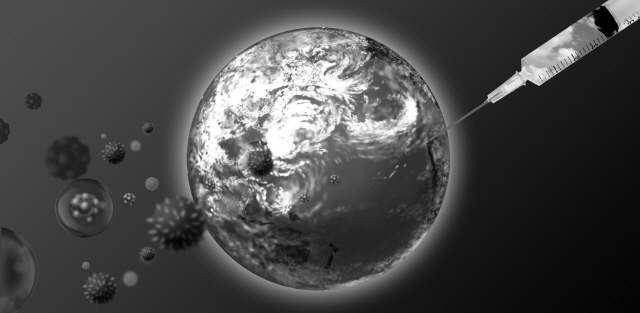필자의 왼쪽 어깨에는 연필 두께만 한 크기의 흉터가 남아 있다. 살짝 솟아올라 있어 보지 않고도 촉감만으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한국인이라면 대개 비슷한 흉터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른바 ‘불주사 자국’이다. 필자가 불주사를 언제 맞았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신체검사를 하는 날 키와 몸무게를 재고 시력검사를 하는 일반적인 코스를 모두 통과한 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양호실 문 앞에 친구들과 번호 순서대로 서 있었다. 그러다가 이름이 호명되면 한 명씩 양호실로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오는 친구들의 표정으로 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았다. 여닫히는 문틈 사이로 알코올램프의 불꽃이 보였다. 그렇게 우리는 차례대로 들어가 불주사를 맞았다.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양호실에 불려 들어가기 직전의 공포감은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다.
수많은 한국인의 어깨에 흔적을 남긴 ‘불주사’는 결핵 예방을 위한 접종이다. 주사 바늘을 통해 우리의 몸속으로 ‘결핵균의 균주(菌株)’가 들어간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우리 몸속에 투여하는 것이다. 상식 밖의 일이다. 이러한 방식을 처음 시도한 사람은 우두법(牛痘法)을 개발한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1749~1823)로 알려졌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제너는 고향 마을로 돌아와 작은 병원을 차리고 환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이 고용한 정원사의 아들인 여덟 살 소년의 팔에 작은 상처를 낸 후 해당 상처에 우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의 고름을 넣는 실험을 한 것은 지난 1796년의 일이었다. 그 소년은 이후 1년 동안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 제너는 이 사실을 논문으로 정리해 왕립학회에 보고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두법의 시작이었다.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에서 빠진 사실이 있다. 무엇보다도 제너가 우두법을 시험할 무렵 인두법(人痘法)이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은 중요한 배경이 된다. 유럽·아프리카·중동 지역 등에서 천연두에 걸린 사람에게서 채취한 병원균을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주입하는 인두법 처치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경미한 증상만으로 천연두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인두법이 효과가 일정하지 않은 위험성이 상존하는 처치법이라는 데 있었다. 제너의 실험은 병원균을 투여하는 것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인두 대신 우두를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우두가 천연두 예방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당시 시중에 떠돌던 민간 지식에 기댄 것이었다. 특히 젖소를 키우는 촌부들은 소젖을 짜는 과정에서 소의 젖통을 손으로 만지게 되는데 이들 중에 천연두를 앓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이 우두에 접촉하게 되면 손에 고름집이 잡히는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있을 뿐 인두에 걸리지 않았다. 현재의 용어로 설명하면 우두는 ‘인수공통(人獸共通) 전염병’이고 우두와의 접촉을 통해 형성된 항체는 인두 바이러스에도 면역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너는 자신의 방법에 ‘백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단어는 “암소의” 또는 “암소로부터”라는 뜻의 라틴어 ‘바키누스(vaccinus)’에서 유래했다.
제너의 우두법은 18세기 후반 의료계와 과학계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균을 그대로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이 갖는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프랑스의 생화학자 루이 파스퇴르(1822~1895)였다. 그는 닭에서 나타나는 콜레라 백신을 연구하던 중 병원균을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배양하면 독성은 낮추면서 항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른바 독성약화(attenuated) 백신이었다. 파스퇴르는 이 발견을 토대로 탄저병과 광견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의료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환자가 질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사후적 대응 차원을 넘어 사전적으로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예방의학의 가능성을 연 것이다.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파스퇴르는 파리에 자신의 이름을 딴 파스퇴르 연구소(Pasteur Institute)를 설립해 여러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나갔다.
필자가 1980년 무렵 결핵 예방을 위해 접종받았던 불주사의 원류는 바로 이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시작됐다. 이 백신은 제너의 우두법과 유사한 원리로 개발됐다. 프랑스의 세균학자 알베르 칼메트(1863~1933)와 카미유 게랭(1872~1961)은 1908년부터 결핵 유방염을 앓고 있는 소에서 얻은 결핵균을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 배양한 결과 인간 결핵균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무려 13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였다. 이 백신은 두 과학자의 이름을 따 BCG(Bacillus Calmette-Guerin)라고 알려지게 됐다. BCG 백신은 192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한국의 어린이들에게는 1962년부터 의무적으로 접종하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 백신을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해 최근 매년 1억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투여받고 있다. 내가 불주사를 맞은 시기로 미뤄봐 아마도 ‘파스퇴르 냉동건조 BCG’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한국인이 맞은 BCG 백신의 균주는 몇 차례 바뀌었는데 균주의 종류에 따라 흉터의 모양도 조금씩 달라졌다. 어쨌든 BCG 접종이 일반화되면서 결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질병이 됐다.
전염병 예방은 한편으로 과학과 의학의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또는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개발된 백신을 수많은 사람에게 접종해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확보하는 것이 전염병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 대부분이 항체를 형성해 면역성을 갖출 수 있게 하려면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기구가 필수적이다. 파스퇴르의 백신 개발이 유럽에서 강력한 국민국가가 등장하던 시기에 이뤄졌다는 사실은 백신과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9세기 중반 이후 전염병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외적으로부터 영토를 지키는 문제와 함께 국가의 기본 책무로 떠올랐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위시해 여러 정부 기구들이 방역을 위해 ‘신체적 거리 두기’를 강제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 소독 작업을 벌이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마스크를 차질 없이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일이 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여진다. 그와 함께 세계 각국의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 상황은 앞으로 국가 기구가 얼마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비집고 들어올 수 있을지를 보여줄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양호실 앞에서 느꼈던 공포감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서울과기대 교수·과학잡지 ‘에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