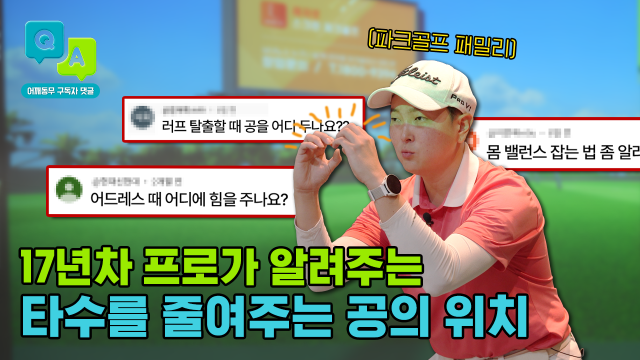국제금융 분야의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세계를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에 빗댔습니다. 그러면서 탈세계화(Deglobalization·디글로벌라이제이션)가 급격한 생산성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는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도로시는 자신의 집과 함께 토네이도에 빨려 들어가 빙빙 돌면서 어디에 내릴지 모른다”며 “우리 사회와 정치, 경제 시스템이 이 같은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른다고 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인식과 같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또 코로나19발 경기침체를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전세계가 동시에 침체에 빠진 첫 사례”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전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위기는 평균 회복기간이 4년이었고 대공황은 10년이 걸렸다”며 “(지금은) 대공황에 좀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잘 해야(at best) U자 형태의 회복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수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회복하는 데는 5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중 생산성 감소에 대한 지적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연한 말 같기도 하지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상황 인식입니다. 그는 “지난 40년 넘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가장 큰 요소는 기술발전과 함께 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다”며 “만약 세계화가 사라지면 아마도 몇몇 기술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무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재편해 본국으로 옮기게 되면 최적의 생산을 위해 짜인 국제분업 체계가 무너지고 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화가 지역화로 변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심해지면 인적, 물적 교류에 따른 기술발전도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겠지요. 당장 중국만 해도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유럽의 혁신기술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될 것이라는 게 미국 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혁신의 핵심 요소인 개방이 사라지는 셈이죠.
생산성이 떨어지면 고비용 사회로 가게 됩니다. 그 부담은 어디로 갈까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과학이 발전하고 원천기술이 있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괜찮겠지만 아직 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인 우리나라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