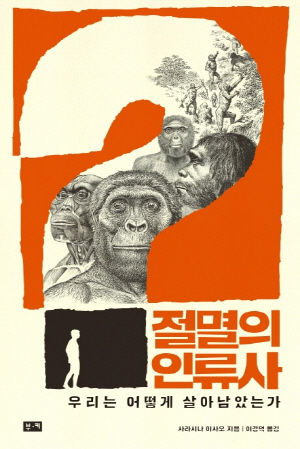인간을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한다. 인간은 불을 사용하고, 언어로 소통하고, 복잡한 기계를 만드는 유일한 존재다. 하지만 현재 인간이 지구의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태초부터 다른 종보다 항상 뛰어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았기에 결론적으로 강한 존재로 평가받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본의 분자고생물학자이자 뼈 전문가인 사라시나 이사오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둔다. 인류 진화 과정이 수백만 년이나 되다 보니 추론과 가설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사라시나는 인류 화석 출토 위치와 뼈의 구조, 탄소 안정 동위체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각 시기에 다른 종보다 열악했던 인류의 특징이 오히려 생존과 진화, 번성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저서 ‘절멸의 인류사’는 7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류와 침팬지류가 갈라져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시점이다.
인류와 침팬지류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직립 이족 보행 여부와 송곳니 크기다. 송곳니는 동물의 몸에 장착된 일종의 무기다. 사자와 같은 육식 동물은 물론이고, 현생 유인원들도 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갖는다. 수컷 유인원들은 암컷이나 먹을 것을 두고 사나운 싸움을 종종 벌이는데, 이때 송곳니를 종종 사용한다. 게다가 난혼이다.
하지만 인류는 달랐다. 같은 무리 안에서 싸워 이겨 생존하는 대신 송곳니라는 무기를 버리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일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식에 대한 인지와 확신이 생기자 여자와 자식을 위한 음식 나르기에 나섰다.
삼림 대신 초원이 점점 늘어난 환경도 약한 쪽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삼림이 줄면서 먹거리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자, 결국 약한 쪽이 안전한 삼림의 나무에서 내려와 삼림 바깥으로 밀려났다. 이족 직립이 강화된 배경이다. 더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식과 여자를 위한 음식을 찾아서 운반해야 했기에 인류는 점점 꼿꼿하게 섰고, 더 빨라졌다.
삼림보다 위험한 초원에서의 생활은 인류로 하여금 더 많은 후손을 낳도록 했다. 진화 과정에서 멸종하지 않으려면 적에게 잡아먹히는 개체 수보다 더 많은 새끼를 낳아야 한다.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도 이뤘다.
아울러 피부를 보호하는 털이 없는 쪽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 포유류의 털은 추위와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지만 먼 거리를 이동하고 달려야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땀이 나는 상황에서는 털이 체온 조절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식으로 수백 만년에 걸쳐 송곳니와 털이 퇴화하고, 이족 직립이 강화되면서 인류의 이동 범위와 속도가 점점 넓어지고 빨라졌다고 말한다. 그렇게 인류는 아프리카를 벗어나 세계 각지로 나가게 된 것이다.
30만 년 전후 인류의 이동과 절멸에서도 약한 쪽이 살아남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멸종한 네안데르탈인과 살아남아 현재의 인간이 된 호모 사피엔스의 서로 다른 운명이 그렇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보다 골격이 더 크고 단단했고 뇌의 크기도 컸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열세였던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 상의 유일한 인류가 됐다. 책은 호모 사피엔스의 신체 조건은 네안데르탈인보다 나빴지만 이동 범위가 더 넓었다고 말한다. 뇌가 클수록 열량 소비가 많은데, 호모 사피엔스는 기초 대사량이 20% 정도 네안데르탈인보다 적었다. 당연히 식량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호모 사피엔스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가 싸움을 벌인 끝에 호모 사피엔스가 이겼다는 학설도 있다. 이에 대해 책은 네안데르탈인과 일대일로 싸우기엔 불리한 호모 사피엔스가 멀찍이 떨어져 투창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 몸이 가벼운 호모 사피엔스가 더 활발히 돌아다니며 사냥감을 선점했을 수도 있다고 추론한다. 아울러 신체적 열세로 인해 더 많은 협력과 연대가 필요했기에 언어 소통이 더 발달했고 공동체가 더 커지고 조직화했을 것이라고 책은 주장한다. 결국 네안데르탈인은 생존 터전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구 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책에 따르면 인간은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타고난 유약함이 오히려 생존과 번성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약했기에 살아남은 것이다. 현재도 지구 상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당장 현재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신종 감염병만 해도 그렇다. 하지만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그랬듯이, 인류는 취약점을 발판 삼아 더 나은 개체로 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만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