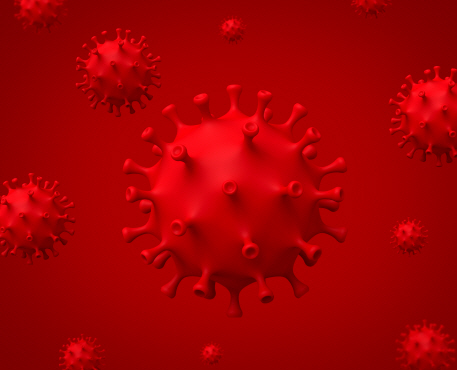그 모든 노력도 허사였다. 그들에게 이제 죽음의 쓰라림은 과거의 일이었다.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람에 대고 속삭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은 가게를 열고, 거리를 쏘다니고, 장사를 하고, 용건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은 채 마주치는 사람 아무하고나 대화하려고 나섰다. 이처럼 무분별하고 경솔한 행동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최대한 조심하면서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모든 인간들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신의 보호 아래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 많이 희생되었다. (다니엘 디포, ‘페스트, 1665년 런던을 휩쓸다’, 2020년 부글북스 펴냄)
‘로빈슨 크루소’의 소설가 다니엘 디포는 인구 밀도가 높았던 런던에 불어닥친 페스트의 공포와 교훈을 정리한 논픽션을 썼다. 카뮈가 ‘페스트’를 쓰며 인용했던 다니엘 디포의 문장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페스트는 사람마다 병증이 약간 달랐다. 그러나 두통과 발열, 터질 듯한 종기와 부기, 역한 고름과 구토 등과 함께 결국 페스트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불에 타는 듯한 고통’ 끝의 죽음이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도 기세와 흐름이 있어 독성이 약해지고 페스트 환자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페스트에 걸려도 죽지는 않는대’라는 소문이 런던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경계심은 흐트러졌다. 바이러스가 약해졌을 뿐 아직 물러가지는 않았을 시점에 런던 사람들은 외출하고 모이고 떠들기 시작했다. 바로 이 시점에 페스트는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차 없이 휩쓸어갔다. 다니엘 디포는 결국 가장 무서운 감염원은 ‘인간의 경솔’이라고 말했다. 1665년 런던을 덮친 페스트로 인해 46만 런던 시민 중 10만여 명이 사망했다. 2020년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경솔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아직 희생양을 물색하고 있다. /문학동네 편집팀장 이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