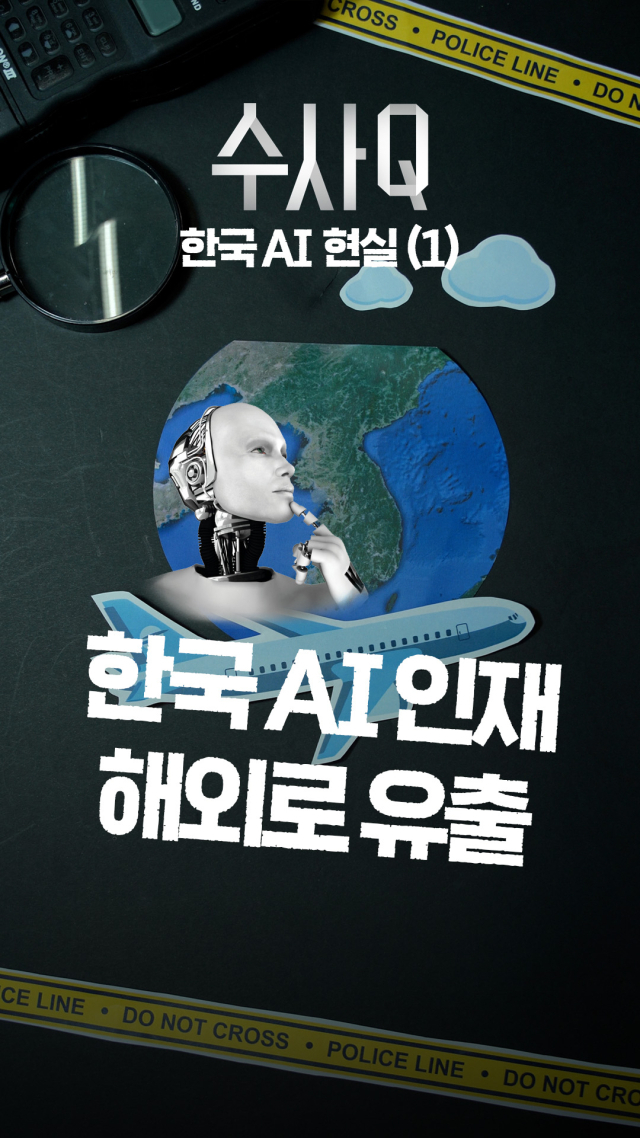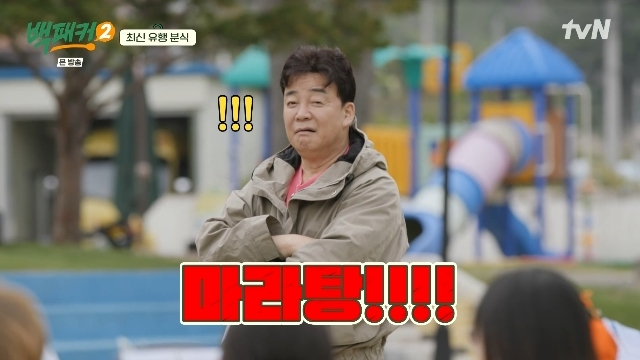지난 10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됐다. 핵심 내용은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는 지난해보다 13.9% 늘어난 1조 1,833억 원으로 하고 이는 오는 2025년까지 6년간 적용하며 올해 이후에는 우리 국방 예산 상승률만큼 올린다는 것이다.
방위비 협상 타결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다음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과 한미 동맹이 ‘안보 이슈의 정치화’ 차원에서 벗어나 ‘안보 이슈의 안보화’ 차원으로 정상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에는 아시아 대륙 핵심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불포기, 한국에는 공산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을 막는 방패 역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소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 순수한 안보 이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 이슈는 그 동안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간 정치 이슈로 변질돼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후(厚)하고 미국에게 인색하다는 인식하에 한국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미군 주둔비를 급격히 증액하려 했다. 그 결과 순수한 안보 문제가 정치화돼 무려 1년 6개월 간 협상을 난항 속에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정치화된 안보 이슈가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속한 타결을 보았다. ‘안보 이슈의 안보화 복귀’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북한의 소망(所望)을 일단 무산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의 숙원 과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다. 북한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렬과 이로 인한 한미 갈등→주한미군 철수를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소망 수용과 바이든 정부와의 갈등이라는 선택을 두고 우선 바이든 정부의 ‘한미 동맹 복원’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소망이 무산된 북한이 향후 문재인 정부에 다른 차원의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이 있다.
셋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인프라 비용이다. 70여 년 남북 분단사에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북한의 대남 공산화 통일 목표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던 핵심 이유는 주한미군의 유지와 한미 동맹의 존재다. 우리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하는 인프라 비용은 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국민들의 성금으로라도 마련하고 투자해야만 한다. ‘국가 생존, 국민 생명과 자산의 안전한 보호’라는 목표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5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책정된 3차 재난지원금 액수는 무려 9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우리의 방위가 잘못되면 국민들 전체 5,000만 명이 영구적인 역사적 재난을 맞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라인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이에서 분명한 자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동맹 관계 복원’이라는 대외 정책 기조는 향후 한국에 분명한 동맹국다운 행보를 요구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을 전제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은 일단 바이든 정부의 동맹 관계 복원에 어느 정도 동의함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전통적 동맹과 대한민국을 사라지게 할 적대 진영을 두고 혼란스러운 행보를 하지 말고 미국의 동맹 관계 복원에 적극 협조하는 행보를 보여야만 한다. 이번 방위비 협상 타결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다.
/여론독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