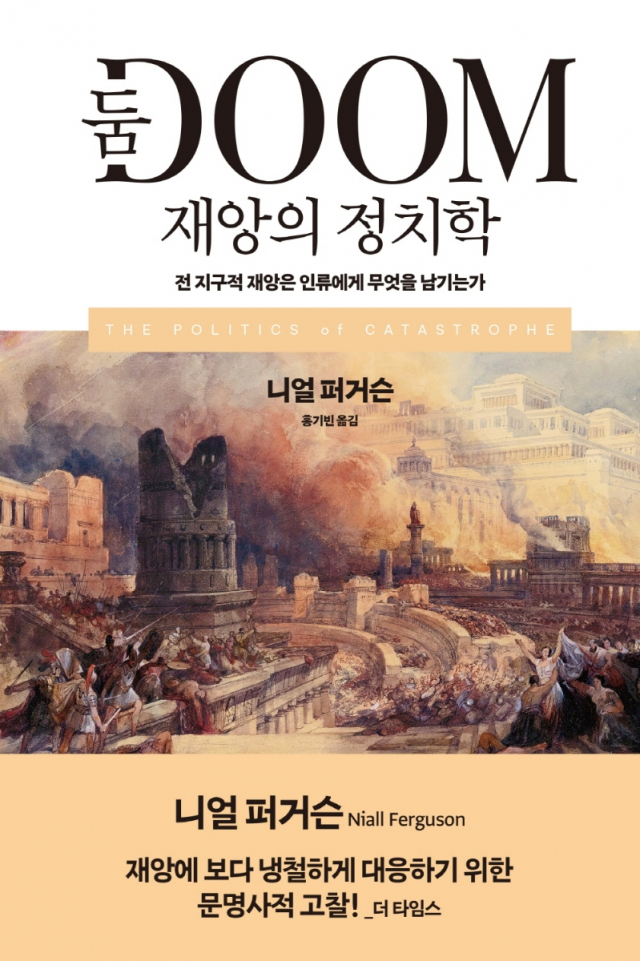인간이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종말’이라는 개념은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 삶에 끊임없이 출몰해 왔다. 과거 종교계를 중심으로 횡행했던 종말론은 현대에 들어서는 핵전쟁, 생화학 무기 등 인간의 이기로 인한 불길한 전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1세기, 인류는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 앞에서 또 한번 이 파멸의 단어를 떠올려야 했다.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은 파멸에 대한 두려움을 키운다. 그런데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과연 ‘세상이 끝난다’는 사실일까. 21세기 최고의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파국이 아니라 ‘대재난이 벌어진 후 우리 대부분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퍼거슨의 신작 ‘둠-재앙의 정치학’은 여기서 출발한다. 앞으로도 재난은 반복될 것이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그 불행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게 전제다. 이 비관적인 전망 속에 책은 지질학·지정학적 재난부터 생물학적·기술적 재난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참사의 역사를 장장 750페이지에 걸쳐 정리했다.
그러면서 저자는 앞으로 다가올 지구적 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저자의 눈에 인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다. 두 나라의 패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면 20세기에 펼쳐진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 기술, 정치에서 양국 갈등이 심해지는 와중에 불거진 코로나 19는 위기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저자는 그러나 백신 개발과 인공지능 등 기술적 수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세계에서 여전히 지배적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의 부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담론 자체가 미국의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석하며 다른 접근의 대응을 모색한다. 저자는 코로나 19가 팬데믹으로 발전한 원인은 전염력 때문 만은 아니라고 봤다. 질병의 태생적 전염력 만큼이나 확산력을 높이는 것은 질병에 감염되는 네트워크 구조다. 저자는 과학 혁명 이전에도 사람들은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조치로 전염병에 대응했음을 언급하며, 정보 기술과 교통 수단이 발달하며 빠르게 변화한 국제적·지역적 네트워크를 간과한다면 또 다른 전염병과 재앙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저자의 메시지는 완전한 ‘파멸(Doom)’이 올 때까지 반복되는 재난을 감내하자는 것이 아니다. 퍼거슨은 “우리가 지금 겪는 재난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폭넓은 시각에서 보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우리의 실수와 오류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라고 강조한다. 3만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