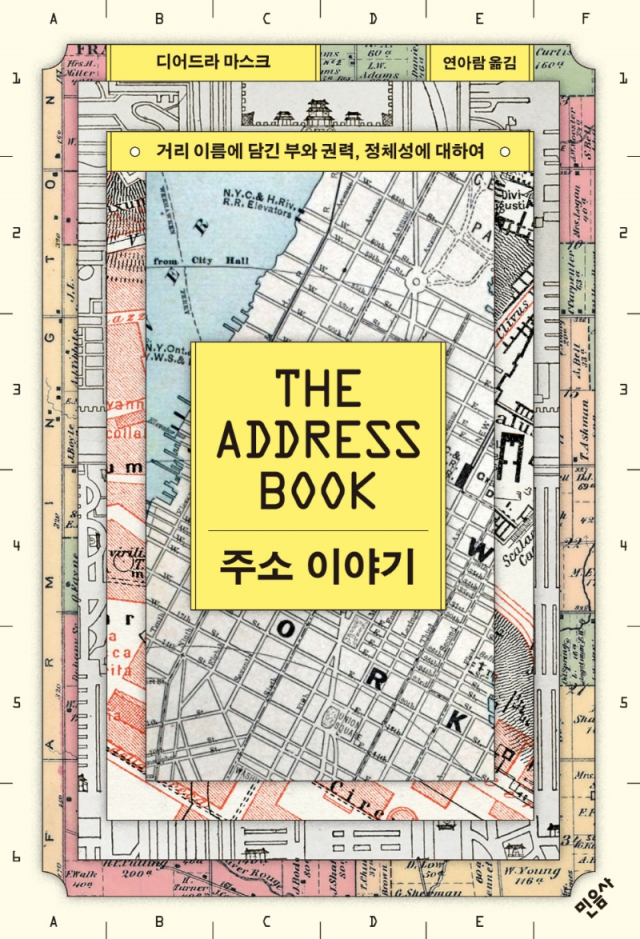대통령이 되기 전,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로 활약하던 1997년의 일이다. 트럼프는 뉴욕 맨해튼 북서쪽 센트럴파크 서쪽에 사방이 황갈색 반사유리로 된 화려한 고급아파트를 신축했다.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센트럴파크 웨스트 1번지’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주소”를 힘주어 광고했다. 사실 본래 주소는 그게 아니었다. ‘콜럼버스 서클 15번지’였지만 트럼프의 부동산 개발회사가 뉴욕시에 주소 변경을 요청했다. 당시 ‘콜럼버스 서클’이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센트럴파크’는 주소만으로도 전망좋고 가치있는 곳임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웃기는(?)것은 트럼프의 건물도 이내 그 ‘주소’를 뺏겼다는 점인데, 몇 년 뒤 타임워너가 바로 뒤에 새로운 고층 건물을 세우고 ‘원 센트럴파크’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그 건물 역시 실제 주소는 ‘콜럼버스 서클 25번지’였다. 뉴욕시는 부동산 개발업자 1인당 1건씩 주소 변경 신청권을 “특가 1만1,000달러”에 판매한다.
뉴욕은 이미 150년 전부터 이같은 ‘주소마케팅’의 심리작전을 활용했다. 웨스트사이드 지역의 ‘판자촌’을 없애기 위해 지역협회는 부동산개발을 지지하며 숫자로 된 거리이름을 “새로 생긴 주의 고상한 이름”을 따 ‘몬태나 플레이스’ ‘애리조나 플레이스’ 등으로 지었고, 런던 번화가의 이름을 붙여 ‘웨스트엔드 애비뉴’라 정했다. “거리 이름은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방법 중 하나”가 됐고 호화로운 이름을 붙인 곳은 호화로운 거리가 됐다.
신간 ‘주소이야기’는 주소의 기원과 역사를 탐색하고 주소 체계와 거리 이름에 담긴 다양한 사회 정치적 이슈를 탐구한다. 내가 사는 곳이 나를 말해준다는 상징적 가치 때문에 주소를 따라 정치경제학이 작동한다.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비싼 뉴욕의 사례처럼 도로명은 정체성과 부(富)로 연결된다. 미국에서는 주소에 ‘레이크(lake·강)’가 들어간 주택은 전체 주택가격의 중앙값보다 16% 비쌌고,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저속한 이름의 거리에 있는 건물 가격은 다른 거리의 건물보다 20% 낮았다고 한다.
중세시대 영국의 거리이름에는 대장간,푸줏간,시장 이름이 붙었다. 위치를 찾는 게 중요했기에 눈에 잘 띄는 대상과 주소를 연결시켰다. ‘아멘코너’는 세인트폴 대성당 주변을 돌 때 그 지점에서 기도가 끝나면서 ‘아멘’이라고 말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근대국가가 등장하면서 세금 징수, 병력 동원 등의 목적을 위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민이 필요했고 “시민들은 기록할 수 있는 이름과 주소로 토지대장에 등록돼야” 했다. 1800년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커져버린 런던은 거리 이름을 지정할 중앙기구가 없어 사설업체에 일을 맡겼다. 업체의 상상력은 형편없었다. 1853년 런던에는 킹 스트리트가 37개, 퀸 스트리트가 27였고, 앨버트 스트리트가와 빅토리아 스트리트가 각각 25개, 프린세스 스트리트 22개, 듀크 스트리트가 17개였다. 15년 뒤 런던 거리이름 조사에서는 메리라는 거리가 35개, 엘리자베스 거리가 58개, 찰스가 64개, 제임스가 47개였다. 직위명이나 건축업자 가족들의 이름이 거리명에 붙였던 것이다.
그렇게 건성으로 지은 이름과 달리 혁명 이후, 정치적 이유로 거리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란의 테헤란에는 ‘보비 샌즈 스트리트’가 있다. 영국 정부에 대항한 무장투쟁단체 IRA 단원이던 북아일랜드의 보비 샌즈가 영국 교도소에 갇혔고 단식투쟁 66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는 독재정부 수립을 조장한 영국에 대한 이란 사람들의 반감을 자극했고 영국대사관 근처 도로명을 ‘보비 샌즈 스트리트’로 덧칠하는 시위(?)로 이어져 마침내 공식 도로명이 됐다. 영국 대사관은 숙적의 이름으로 불리는 보비 샌즈 스트리트가 아닌, 다른 쪽 거리로 출입구를 옮겨야 했다.
거리 이름은 정치적 선전 도구로도 작동했다. 독일의 농촌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살던 ‘유대인가’가 많았지만 나치 시대에 히틀러의 이름을 딴 거리의 등장과 함께 일제히 바뀌었다가 훗날 복원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어떤 인물의 이름을 따 거리이름을 새로 지었는지만 보더라도 동독과 서독의 분단을 예상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도로명 짓기에 열 올리는 이유다. 저자는 “도로명은 정체성과 부에 관한 문제이며, 인종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왜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권력’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한다.
한국의 주소이야기는 일본과 함께 짤막하게 등장한다. 서양인의 입장에서 도로명 없는 일본은 길찾기가 힘든 곳인데, 17세기에 장방형의 ‘초(町)’로 작은 구획을 나눈 탓에 굳이 도로명이 필요없었기 때문이다. 주소체계가 도로명 대신 구획 중심의 번지수로 사용된 것은 2011년 이전의 한국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이를 한 칸에 덩어리째 글자를 쓰는 문자체계의 특수성으로 접근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주소가 단순히 위치를 지정하는 수단을 넘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