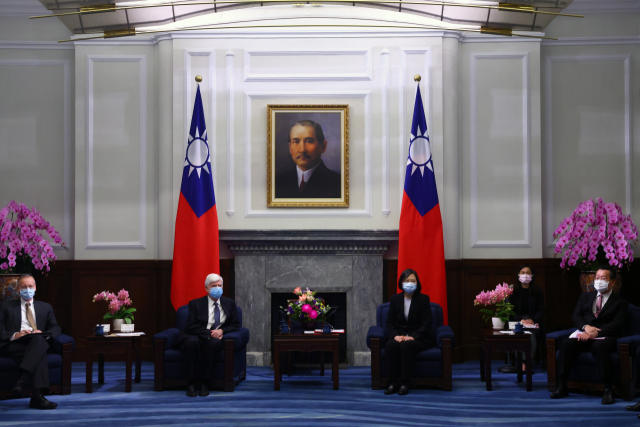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대만 간 교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중국산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이 양국 간 무역을 키운 원인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미국-대만 간 ‘밀착’이 외교·안보뿐 아니라 통상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대만 對美 수출 70% 급증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만의 대(對) 미국 수출은 올해 9월 720억달러(약 85조원)를 기록해 1996년 말(300억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같은 기간 미국이 타이완에 수출한 규모도 348억달러(약 41조원)로 역시 1996년 말 185억달러보다 90% 가까이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3월 시행한 중국산에 대한 25% 고율 관세가 이 같은 교역 증대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타이완 대미 수출은 중국산 고율 관세가 부과되기 전인 2017년 대비 70%나 껑충 뛰었다.
시작은 트럼프 정부가 했지만, 미국-대만 간 통상 강화의 원동력은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반(反) 중국’ 정책이라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월 중국산에 대한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바이든 정부 ‘대 중국 무역 정책’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트럼프식 통상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대만은 석유 수입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반도체 부족으로 대만은 미국한테 더욱 필요한 존재가 됐다. 실제 미국이 타이완으로부터 수입한 가장 많은 품목이 반도체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글로벌 1위 TSMC를 보유한 대만은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칩 공급처로 떠올랐다.
반대로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석유와 기계 부품, 자동차 등 수입이 늘었다. 대만은 석유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를 추구하는데, 미국이 그 대안이 되고 있는 셈이다. 양국 간 이해 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진 셈이다.
대만 기업, 中서 공장 빼 본국 ‘유턴’ 러시
대만이 최근 중국에서 본국으로 생산 공정을 ‘유턴’하는 자국 기업에 세제 등 각종 지원을 늘리는 것도 미-대만 통상 강화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중국에서 상품을 생산해 수출하면 미국으로부터 높은 관세를 적용 받지만, 대만에서 만든 물건은 관세에서 자유롭다. 또 미국이 대만과 직접 교역을 확대하는 만큼 굳이 중국을 거칠 필요성이 적어진다는 설명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0개 이상 기업이 중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총 기업 규모는 300억달러에 이른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실리적인 이유로 대만과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