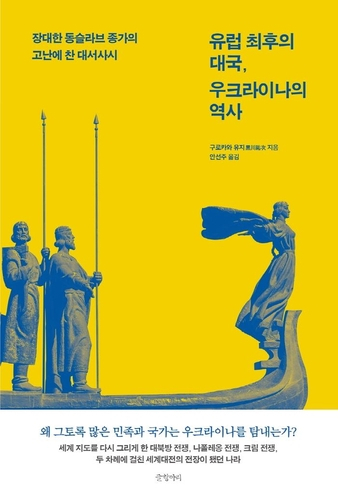‘유럽의 빵 바구니’, 최근 러시아와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된 우크라이나 일대의 별칭이다. 전 세계의 비옥한 흑토지대 중 30%를 점유해 밀은 물론 설탕의 원료인 사탕무 등이 많이 재배되는 곡창지대인 덕이다. 철광석, 석탄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 소련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는 최대 공업지역이기도 했다. 18세기 후반부터 1991년까지 우크라이나를 지배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되찾고 싶은 ‘집토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 반(反) 러시아 정서는 그 뿌리가 깊다. 국내 출간된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우크라이나의 기원전 고대에서 1990년대 초반의 역사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저자인 구로카와 유지는 전 주우크라이나 일본 대사이자 니혼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를 역임했다.
우크라이나인은 수백 년 간 나라 없이 지내면서도 끈질기게 언어, 문화, 관습 등 정체성을 지켜왔다. 12세기까지는 루스 카간국에서 키예프 공국으로 이어지는 대국의 중심이었다. 러시아는 15세기만 해도 키예프 공국 지배 하의 비슬라브 부족들의 연합체일 뿐이었다. 러시아의 화폐 단위 ‘루블’은 키예프 공국에서 쓰던 은괴 단위인 ‘흐리브냐’의 절반을 가리키던 말에서 유래했다. 우크라이나는 화폐 단위를 ‘흐리브냐’로 이름 붙이며 키예프 공국의 정체성을 이음을 확실히 한다.
역사학계에 따르면 ‘최초의 우크라이나 국가’는 키예프 공국의 후예로, 1340년대까지 현 우크라이나 인구의 90%가 거주하는 지역을 지배한 할리치나-볼린 공국이다. 이 국가가 사라진 후에는 준군사적 자치 공동체인 ‘코사크’가 형성됐다. 이후 18세기 후반 러시아에 병합된 우크라이나는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당시 독립을 위해 분투했지만 유럽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휩쓸려 뜻을 이루지 못한다. 마침내 독자적 국가를 세운 것은 1991년의 일이다.
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이유도 설명한다. 곡물·설탕·석탄·금속 등의 산업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서유럽과 러시아, 아시아를 잇는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도 유럽의 힘의 균형을 좌우하는 요지다. 러시아 혁명 당시 볼셰비키와 왕당파 모두 우크라이나 독립에 반대했고, 볼셰비키는 무력으로라도 우크라이나를 수중에 넣으려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저자는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유지하고 안정되는 것이 유럽,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 중·동유럽 국가 입장에선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한다. 독립 후 30년 만에 우크라이나에 닥친 위기에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1만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