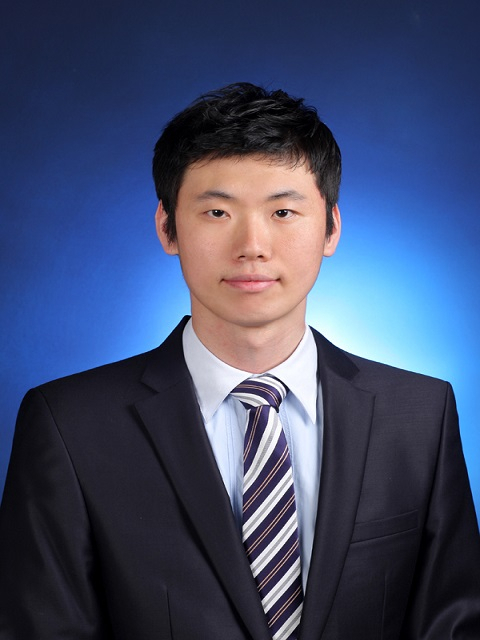“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
정부가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125조 원+α(알파)’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지만 핵심 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연이어 ‘스텝’이 꼬이고 있다. 16일 대규모 설명회를 예고했다가 이를 번복하더니 18일 예정했던 세부 계획 발표도 돌연 연기하고 금융기관 설명회만 개최한다. ‘최대 90% 원금 감면’ 등의 파격적인 내용이 성실 상환자의 역린을 건드린 모양새다. 정책 파트너인 금융사 ‘패싱’ ‘불통’ 논란까지 더해져 사안은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도덕적 해이 논란은 비슷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제기됐는데 사전에 이를 적극 반박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자는 새출발기금 도입 취지에는 대부분이 십분 공감한다. 금융사들도 고통 분담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역설한 대로 “2000만 대한민국 차주 중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는 70만 명, 자영업자·소상공인 330만 명 중 10만 명으로, 3%를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설치된 국민행복기금 사례를 보면 80% 이상 감면을 받은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1.5%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18년간 추진된 역대 빚 탕감 제도의 완제율(빚을 다 갚은 비율)도 60.2% 수준이라고 하니 도덕적 해이 우려는 다소 과장된 기우인 게 사실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공식 석상에서 거듭 ‘오해’라며 일축하는 이유일 터다. 신용불량자는 7년간 정상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커 제도 악용 가능성도 낮다.
그럼에도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반복된 ‘빚잔치’가 정치적 부산물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수하는 최대 90% 원금 감면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힌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의 연장선에 있다. 이런 정치 논리가 아니라 탄탄한 경제적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