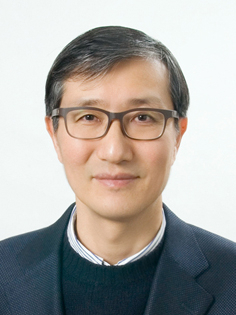서구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에는 벤처기업과 같은 스타트업들을 키워내 낡은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스타트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다. 영국이 대표적이다. 이 나라는 매년 6%의 고성장 기업들이 신규고용의 54%를 만들어 냈음(2009년 기준)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을 등장시켰다. 스케일업 정책이다. 스타트업을 만들어 내는 것에 더해 기업규모를 키워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가한 것이다. 그 결과 유럽 유니콘 기업의 40% 이상이 영국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유럽과 미국이 이 정책에 동참했다.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런 흐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가젤기업 육성책이다. 최근 3년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1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스케일업을 위한 동력은 매우 약하다. 스케일업 정책을 일자리나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국가생존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약자보호나 형평성 같은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스케일업 정책을 철저히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본다. 이들은 이 정책을 ‘스케일업-스케일러-슈퍼 스케일러’의 3단계로 구분해 펼치고 있다. 스케일업은 100만 달러 이상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 스케일러는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그리고 슈퍼 스케일러는 10억 달러 이상 투자유치를 한 기업을 말한다. 스케일업 정책이 소기업(스타트업)-중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정책이 불가능하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힘없고 연약한 기업들에게 지원해야지, 다 커 먹고 살만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논리 때문이다. 여기에 충실한 대표적인 것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간 정책이다. 기업이 설립되어 보증을 받은 후 10년 정도가 지나면 보증 축소에 들어간다.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에게 이 기간은 스케일업의 중심기다. 당연히 가장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다. 은행에 모든 담보를 다 잡혀 기댈 곳이라곤 신용보증기금인데 이 시기에 보증 축소가 시작된다.
서구사회라고 형평성이나 약자 보호를 몰라 스케일업 정책을 들고나온 것이 아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국가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불행히도 한국은 기업이 태어나 성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자리와 국부를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래서 한국의 미래가 밝을지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