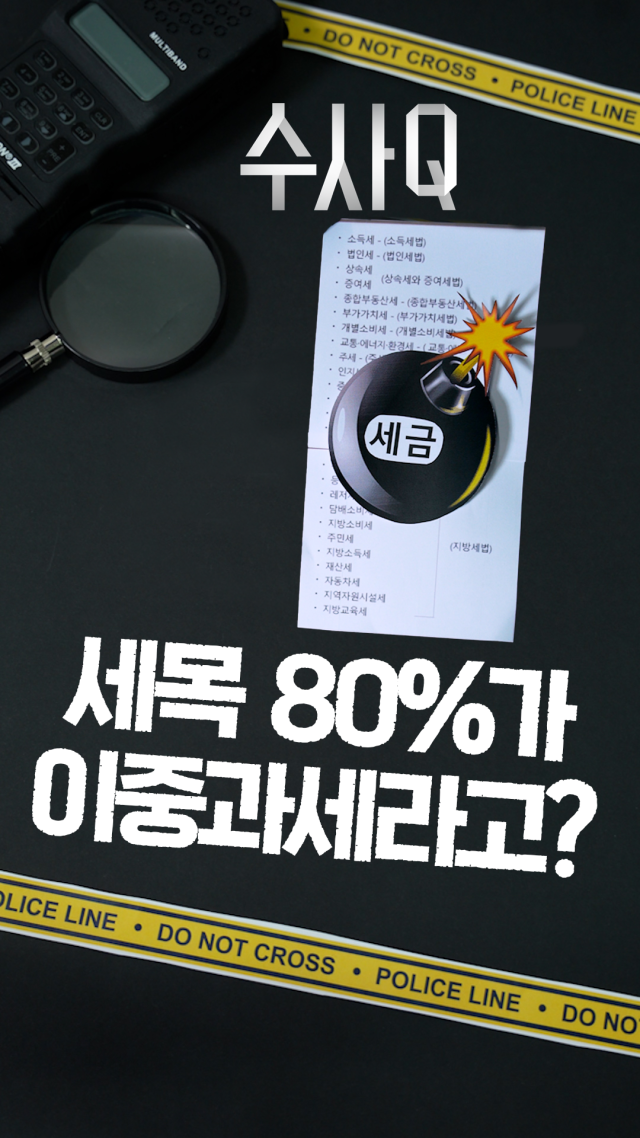“문화재 환수 업무를 위해 해외 경매 사이트에 어떤 문화재가 나왔는지 매주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4990건의 모니터링을 진행했죠. 응찰, 매입, 관련 업무에 대한 대외 홍보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단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해외 반출 문화재 국내 환수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강혜승(사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유통조사부장은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재 환수 업무야말로 극한 직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장은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때부터 함께했던 원년 멤버다. 이후 경영 지원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2019년 문화재 환수 업무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해외로 나간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크리스티’나 ‘소더비’ 등 글로벌 경매 업체의 입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한국 문화재는 매주 100건 이상이다.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는지, 희소성은 얼마나 되는지, 응찰을 할지 등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 그는 “경매가 결정되면 국내에서 자문단 중심으로 구매 여부, 가치 평가, 상한가 설정 등을 세 번에 걸쳐 평가한다”며 “최종 판단까지 최소 3~4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일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실제로 올 초에는 조선시대 휴대용 해시계 ‘일영원구’를 포함한 4건의 문화재 구입 업무가 몰리면서 부원들끼리 식사도 제대로 못 했다고 한다.
문화재를 환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보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미술상이나 경매 업체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우리 문화재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일본 등 해외 박물관의 수장고를 찾아다니며 목록을 만드는 등 실태 조사가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쌓다 보면 뜻하지 않은 횡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영원구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었던 것도 워싱턴 공사관에 있는 사무소로 연락이 왔기에 가능했다.
경매를 통한 환수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3건의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다. 입찰 경쟁이 심해지면서 낙찰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탓이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못 할 것도 없다. 하지만 문화재 환수를 위한 예산은 올해 45억 원에 불과하다. 무한정 입찰가를 올릴 수도 없다.
강 부장은 “우리는 결정된 입찰 상한가에서 단 1원만 넘어도 경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몇 개월 동안 조사하고 회의를 한 결과물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래도 올해는 성적이 좋은 편이다. 그는 “얼마 전 우리 품으로 돌아온 ‘일영원구’나 ‘독서당계회도’ 같은 문화재는 워낙 유명하거나 독특한 것들이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재 환수에는 두 가지 불문율이 존재한다. 하나는 구매 가격을 결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칫 금액이 알려질 경우 다음 문화재 구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영원구의 매입 가격을 다른 문화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강 부장이 입을 굳게 다문 이유다. 또 하나는 왕실 문화재의 경우 절대 구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선 왕실에서만 쓰던 것이 해외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 반출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강 부장은 “왕이 쓰던 옥새인 어보는 해외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며 “이 경우 절대 구입하지 않고 문화재청 등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장에게는 아쉬움이 하나 있다. 문화재 환수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예측하기가 힘들다. 경매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개인 소장자가 갑자기 나타나 문화재를 팔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집행률이 낮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5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삭감됐다. 강 부장은 “문화재 환수에 일반적인 예산 논리를 적용하면 일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우리 재단에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