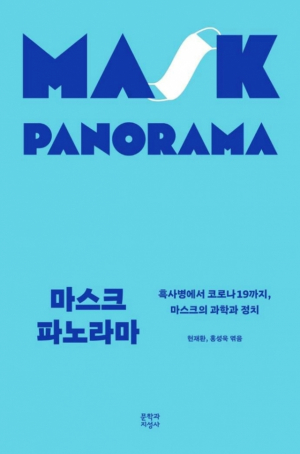정부가 지난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제를 완전히 해제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그대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 이유지만 그 뿐만은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과는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격한 불만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물론 마스크에 대한 우호적 인식은 일본이나 홍콩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신간 ‘마스크 파노라마’는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따른 마스크 착용에 대해 동서고금을 궁구해 정리한 책이다. 마스크의 역사부터 시작해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전방위적으로 다뤘다.
팬데믹 이전에 이미 한국인은 마스크에 익숙했다는 것이 도움을 줬다는 지적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것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다. 황사와 미세먼지 등 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개인보호장비로 마스크가 사용됐다.
덩달아 국가적으로도 마스크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졌고 품질보증 제도도 마련됐다. “마스크가 한국인의 일상적인 사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꽃가루 문제에서, 홍콩과 대만·중국에서는 사스의 확산에 따라 각각 마스크와 친숙해졌다. 서구의 일부에서 동아시아의 문화적 풍토라든지 정치체제를 언급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책은 현재환 부산대 교양교육원 교수, 홍성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 섀로나 펄 미국 드렉셀대 부교수 등 국내외 연구진이 질병, 젠더, 인종,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마스크를 둘러싼 의학적·과학적·역사적 논의를 살핀다.
역사상 마스크를 처음 사용한 것은 의사들이었다. 18세기 초반 사람인 스위스 제네바 의사 장 자크 망제가 쓴 ‘전염병학 개론’을 보면 이른바 ‘새부리 마스크’를 쓴 의사의 모습이 등장한다. 새부리 안에 들어 있는 방향제가 외부의 악취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페스트 등 감염병으로 마스크 착용자를 보호했다.
이후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마스크가 등장했다. 1911년 만주 페스트 유행 당시 현재와 같은 방역용 마스크가 사용됐다. 한국에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마스크가 보급됐고 1930년대 멋으로서 마스크를 쓴 젊은이들이 경성(서울) 시내를 활보해 ‘마스크당(黨)’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행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1만8000원.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