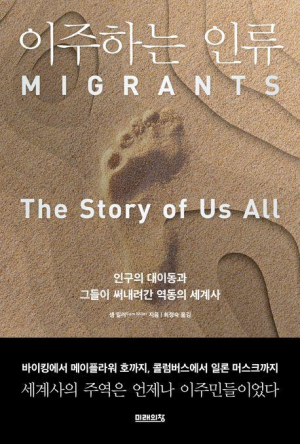#. 전쟁에서 패한 진영에 속한 30대 A씨는 자신이 살던 아시아 지역을 탈출하기로 결심한다. A씨는 다른 난민들과 함께 튀르키예 해안가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갔다. 살아야겠다는 의지 외에 뚜렷한 목적지는 없었다. 일단 북아프리카 튀니지로 간 A씨는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곳에 정착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바로 위쪽에 있던 이탈리아가 눈에 밟혔다. 다시 배를 타고 로마 인근 오스티아 항구에 도착한 A씨는 역시 분쟁 중이었던 그 지역 고위인사의 심복이 됐고 그의 딸과 결혼했다.
A씨는 누구일까. 시리아나 우크라이나 난민 이야기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 정답은 고대 로마제국의 시조인 아이네이아스다. 그가 탈출한 곳은 현재 튀르키예 서부에 있던 트로이다.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그리스·튀르키예의 전쟁을 피해 이탈리아로 이주한 셈이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류 이주의 대강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 스토리는 보여준다.
영국 언론인 샘 밀러가 쓴 신간 ‘이주하는 인류’(원제 Migrants, the Story of Us All)는 인류의 대이동 과정과 그 이유를 추적한 책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주민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인류는 결국 지구상의 어디에서 어디로 계속 이동해 왔다는 것이다. 그들을 이민자라고 부르든 난민이라고 하든 결국은 이들과 공존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최근 심각해지는 ‘난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온다는 것이다.
사실 이주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정주가 옳다는 ‘정주주의’가 덧씌운 것이다. 일단 고정된 주택과 농지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주민을 위협적이고 해로운 존재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인류가 유인원에서 갈라져 나와 ‘인간’이 된 이후 그때까지 살던 아프리카를 탈출했고 이어 전 지구로의 이동이 시작됐다.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10만년전 아프리카를 떠나 전세계로 흩어졌다. 이중에서 특히 ‘야간족’은 남극에 가까운 남미 끝단까지 이주하는, 지금으로 봐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
수렵채집을 하던 사피엔스들이 특정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만년 전부터다. 현재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농사를 ‘발견’한 후 정착했고 이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대신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이주민들을 야만족으로 취급하면서 갈등이 불거진다.
물론 그렇다고 야만적이지 않은 인류의 이주가 멈춘 것은 아니다. 저자는 성경에 나오는 에덴동산, 노아의 방주,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의 이동, 그리스·로마의 정착지 건설,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사업, 북유럽의 바이킹 이동, 콜럼버스 이후의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이주, 노예 무역, 중국 등 황색 위협론, 유대인, 현대의 이주 노동자 등 역사 및 신화 속의 주요 이주 사례를 제시한다.
이주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도 진행되지만 노예무역 같은 강제적 이동도 포함한다. 새로운 이주민을 받아들인 국가와 사회는 부강해진 경우도 있고 거꾸로 유입된 전염병이나 약탈에 의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저자가 봤을 때 이주는 불가피한 일이다. 과거에도 그렇게 21세기에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전쟁은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 경제적 곤란도 이주를 부추긴다. 부유한 나라들도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 이민자를 필요로 한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이동을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역사상 이주가 늘 있어왔기 때문에 저자는 ‘호기심 유전자’라는 것이 인류의 DNA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저자는 “역사상 특정 민족의 근원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지역들은 기껏해야 그들 조상들이 통과한, 깊은 역사 속의 임시 거주지에 불과하다”며 “이주민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고, 인류 역사에서 이주가 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1만 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