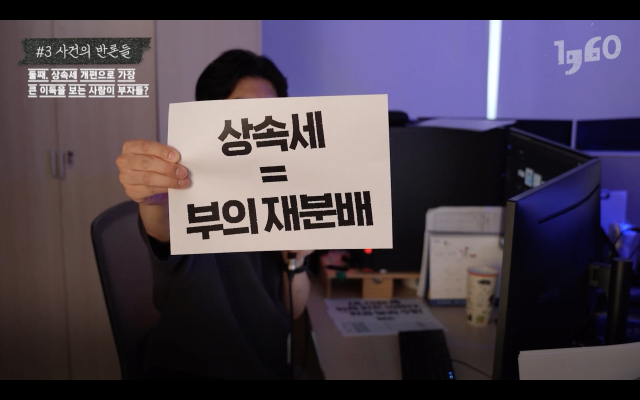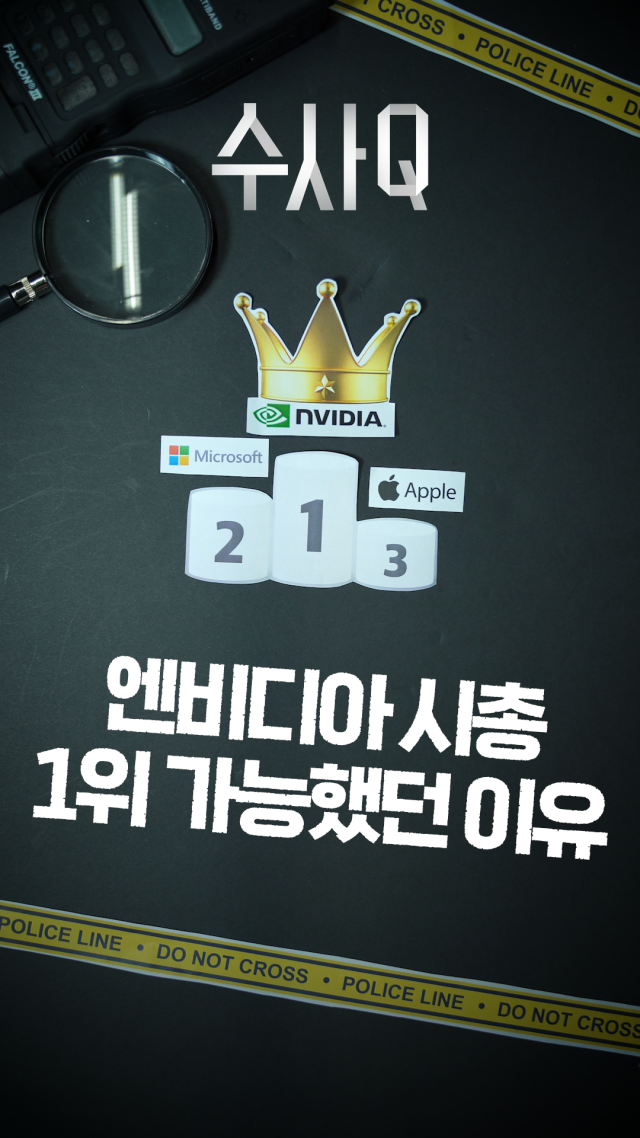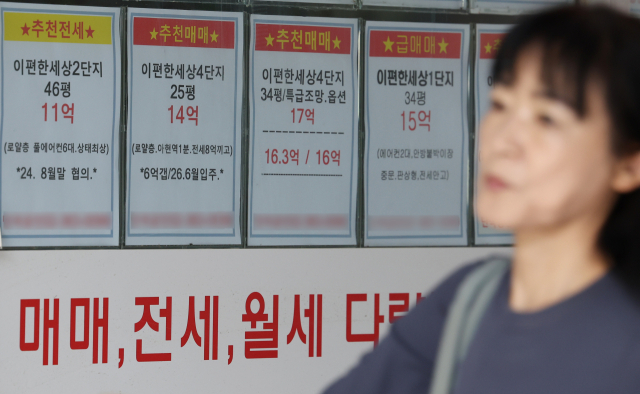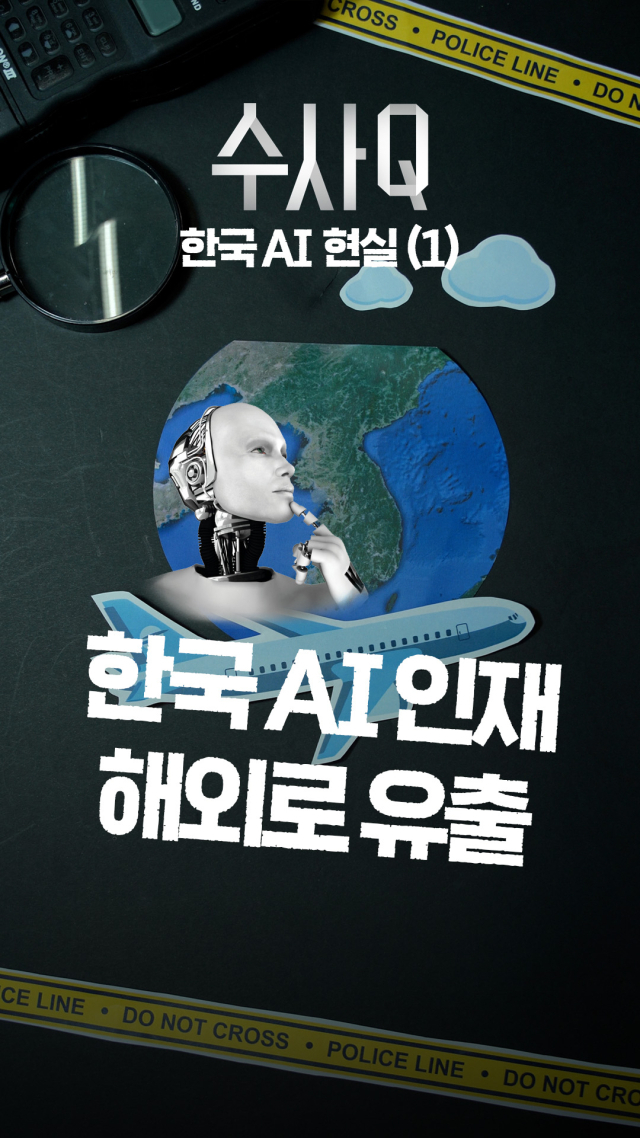그리고 그만큼의 세월 동안 그들의 지성과 창의성에 감동을 받아왔다. 지금껏 선정된 90명과 마찬가지로 올해 선정된 10명의 혁신적 과학자들도 과학이 어디까지 진보할 수 있는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효과가 우수한 약을 만들거나 저비용 진료기술을 개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으며 태양 플라즈마, 기하학의 새로운 방법론 등 한층 형이상학적이고 개혁적인 연구로 도전자 정신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40세 미만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미래는 창창하며 그만큼 과학의 미래도 밝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봐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들 때문이다.
PHOTOGRAPHS BY JOHN B. CARNETT
야프 더 루드 34세 에모리대학 진화생물학
“저는 북미 왕나비로 연구를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 녀석들을 너무 좋아해서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멋진 기생생물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걸 알고는 마음을 바꿨죠.” 야프 더 루드의 마음을 돌린 기생생물은 바로 ‘오프리오시스티스 일렉트로시르하(Ophryocystis elektroscirrha)’. 이 생물은 나비의 피부에 구멍을 뚫어 체액을 유출시키면서 피해를 입힌다.
그런데 루드는 늪지 아스클레피아스를 주식으로 삼은 북미 왕나비와 달리 열대 아스클레피아스를 먹는 개체들은 이 기생충의 피해를 덜 입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어쩌면 몇몇 북미 왕나비가 기생충 퇴치를 위해 스스로 열대 아스클레피아스를 먹는 것일지 모른다는 ‘자가 치료(self-medication)’ 가설을 세웠다.
“어떤 동료가 그러더군요.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라구요. 나비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나요.” 실제로 자가 치료는 고등동물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능력이다.
침팬지, 코끼리 같은 극소수 동물만이 약을 사용해 병을 고치는 행위가 관찰됐기 때문이다. 가설의 입증을 위해 루드는 기생충에 감염된 북미 왕나비 애벌레가 어떤 먹이를 먹는지 살폈다.
애벌레들은 열대 아스클레피아스를 고집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애벌레들이 열대 아스클레피아스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성충은 달랐다. 건강한 개체와 기생충에 감염된 개체를 비교해보니 하나의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기생충에 감염된 암컷 성충들은 알을 낳을 때 열대 아스클레피아스에 낳는 것을 선호한 것. 이는 자신으로부터 전이된 기생충에 따른 자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발견은 인지적 복잡성을 가진 동물들만이 약물을 사용한다는 기존의 관점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신경계가 단순하고 집단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나비조차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 아직 발견되지는 못했지만 자가 치료가 의외로 동물의 왕국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