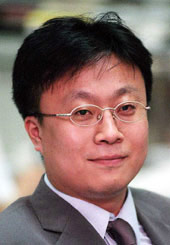|
[동십자각] 자살, 극복해야할 망국병 사회부=최인철차장 michel@sed.co.kr 지난주 서울경제신문 창간 51주년 특집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을 살리자'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게재했다. 취재를 하면서 자살자 유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이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선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았다. 오지랖 넓기로 유명한 우리 정서가 자살자 유가족의 상처받은 가슴을 더욱 후벼 파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살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에게 주변 친구나 친지들이 "그런 몹쓸 놈은 차라리 잊어버려", "부모 마음에 못박은 나쁜 자식"이라며 위로를 건네는 일이 많았다. 심한 경우 아들을 자살로 잃은 노부모가 남편을 떠나보낸 며느리에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는 극언을 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자살자 가족이라는 주변의 차가운 인식과 눈초리가 그들을 힘들게 한다는 게 유가족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보낸 후 극심한 심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자살자 유가족들에게 사회의 뿌리깊은 부정적 인식이 한번 더 상처를 입히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 자살자 유가족은 "자살한 아들의 고통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보낸 후에야 아이가 느꼈을 고통의 깊이를 알게 됐다. 미안함과 죄책감에 숨만 겨우 쉬고 있을 뿐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다"라며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호소했다. 기자도 실제로 자살자 유가족의 심정을 접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당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자살예방 전문가들은 "한 명의 자살자가 부모형제, 친구, 동료 등 10여명에게 자살이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자살자 유가족들이 뒤를 이어 자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를 넘어서는 산술적 선진국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연간 1만5,00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나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선진'의 의미는 이미 퇴색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말이다. 자살은 반드시 사회구성들이 힘을 합쳐 극복해나가야 하는 망국병이다. 삶의 질 향상이 확보되지 않는 한 자살이라는 선택이 줄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힘들어하는 가족ㆍ동료ㆍ친구들을 살피고 격려하며 살아가자. 사람을 살리는 길만큼 소중한 일은 그 어디에도 없다. [생명을 살리자] 기획연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