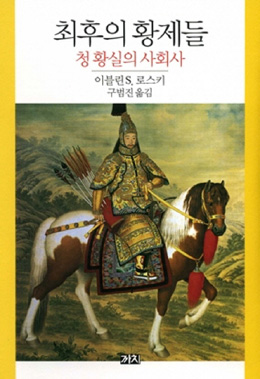홈
사회
사회일반
[책과 세상] 유연한 정책으로 한족 다스린 靑 왕조
입력2010.12.31 18:04:09
수정
2010.12.31 18:04:09
■최후의 황제들(이블린 S.로스키 지음, 까치 펴냄)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기 직전의 중국은 청나라(1644~1911)가 마지막 왕조로서 지배했었다. 한족(漢族)이 아닌 만주족이 세운 국가 청나라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고 그 역사가 오늘날 중국의 밑거름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 이전의 명나라 황제들이 줄곧 자금성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청 황제들은 베이징을 벗어나 교외의 별궁에서 정무를 처리하는 일이 많았다. 젊은 황제 강희제는 창춘원(暢春園)을 즐겨찾았고 건륭제는 원명원(圓明園)을 좋아했다. 황제가 자금성에 머무는 시간이 1년의 약 3분의 1뿐인 경우도 있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오랫동안 청와대를 비우는 격이니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감안할 때 납득이 어려운 현상이다. 청나라는 이처럼 여러 지역에 수도를 분산해 둔 '다중 수도'체제를 고수했다. 이는 비한족(非漢族) 정복 정권인 거란이나 여진, 몽골족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계절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던 민족적 습성의 잔재로 볼 수 있지만 달리 보면 이것이 여러 지역에 집권적인 통치기구를 설립하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국의 중국사학자인 저자는 이같은 청 황실의 특성을 분석해"청나라가 이룩한 성취의 열쇠는 내륙 아시아에 거주하는 주요 비한족 민족들을 겨냥해 유연하면서도 문화적으로 구체성을 띤 정책들을 실천에 옮긴 능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청나라 황제들이 성공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한족에 동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한족 왕조와 다른 통치전략을 썼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상당수 역사학자들이 청의 한화(漢化) 정책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사뭇 다른 관점이다.
황실 여성들의 삶도 달랐다. 청 황실은 황후들을 황족에 통합시켰다. 이는 황후들이 친정 가문과의 관계를 청산하게 유도했고 황후 가족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했다. 청의 역대 황태후들은 자신의 친정 가문이 아닌 남편의 형제들과 섭정을 했다. 외척이 득세했던 한족 왕조와는 대조된다.
흔히 학계에서는 청나라가 한족 문화에 흡수된 증거로 만주어가 사라졌다는 점을 거론하지만 저자는 "청 황제들이 만주어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만주족 정체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 시각"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청 황제들은 정치적 실익을 따져 한족의 관습을 채택 혹은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책은 청나라 궁정의 물질문화, 사회구조, 의례 등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학술적 가치가 큰 책인 대신 대중적 인기를 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유익한 책임은 틀림없다. 세계화 속에 정체성이 흔들리기 쉬운 현대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2만5,000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