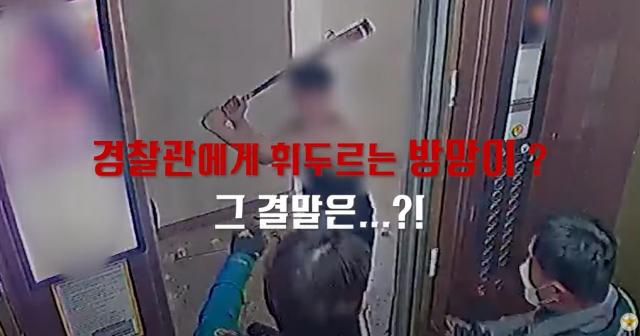정통부·시민단체 인하-무료화 공방…이통사선 반발<BR>전문가들 “무조건 무료화 보단 타협점 찾아야”
이동전화 발신자번호표시(CID)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요금 조정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요금 인하가 이뤄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현재 부가서비스로 규정된 CID요금을 기본요금에 편입시켜 요금을 조정한 후 SMS 요금 인하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쟁의 초점은 우선 CID요금에 맞춰지게 됐다. 그러나 정통부가 추진하는 CID 요금의 기본요금 편입은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무료화’와는 거리가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월 CID요금은 ▦SK텔레콤(SKT), KTF 1000원 ▦LG텔레콤(LGT) 2000원 등이고, SMS요금의 경우 3사 모두 1건당 30원이다.
◇‘기본료 편입’과 ‘기본 서비스’는 별개의 의미=“CID요금을 기본료에 편입시키겠다”는 정통부의 방침은 “CID는 기본서비스”라는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시민단체가 말하는 기본서비스란 CID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3,600만명 가운데 80~90%가 이용하고 있는 데 반해 이통업체들의 추가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 서비스인 만큼 ‘무료화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반면 정통부의 기본요금 편입 방침은 무료가 아니라 ‘요금 인하’에 무게가 실려 있다.
특히 진 장관의 ‘기본료 편입’ 발언은 사실상 1위 사업자인 SKT를 겨냥한 것이다. 이동통신요금의 경우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SKT만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 KTF와 LGT는 정통부에 대한 신고만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SKT의 인가 대상 요금도 ▦최초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요금 등 단 4가지로 한정돼 있다. 현재 CID는 부가서비스로 구분돼 정통부의 인가 대상은 아니다. 진 장관이 CID 요금을 기본료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SKT의 CID요금을 조정하려면 ‘기본료 편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동통신업계 수익급감 우려로 반대=SKT 등 이동통신업계가 CID 요금조정에 반발하는 것은 알토란 같은 수익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SKT의 CID요금이 기본료에 편입되는 형태로 인하될 경우 KTF와 LGT도 똑 같은 가격인하 압력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KTF 관계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3,600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SKT 가입자들(1,900만명)이 요금 인하혜택을 보는데 KTF와 LGT 가입자들도 가만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의 경우 이동통신업계의 CID 및 SMS 매출은 7,71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CID 매출은 3,652억원이었다. 따라서 이통업계는 CID 요금 조정을 곧 거대한 수익기반 상실 위기로 받아들인다.
◇기본료 편입돼도 ‘산 넘어 산’=CID요금을 기본료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조정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기본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간 CID를 사용하지 않는 20% 가량의 가입자들이 ‘역차별’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SKT 등 3개사의 표준기본요금은 1만2,000원(LGT)과 1만3,000원(SKT와 KTF). 기본요금에 정해진 무료통화시간을 다 쓰고 나면 통화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별도로 내는 통화료도 평상시간 기준 LGT와 KTF가 10초당 18원을 받는 반면 SKT의 경우 10초당 20원이다. 3개 업체는 또 평상시간과 별도로 ▦심야시간 ▦할인시간 등을 통해 요금을 깎아주는 차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서 CID요금이 조정되더라도 올해 안에 소비자들에게 가시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도 이처럼 요금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적정 CID요금 수준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업체들이 매출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편법적인 요금체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LGT측은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가입자에게 편하다고 해도 돈이 되지 않는 공짜 신규서비스를 왜 발굴해 내겠느냐”며 “단지 원가가 낮다는 이유로 요금 폐지 혹은 인하가 관철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리적 가격 수준 도출이 관건=전문가들은 요금 무료화보다는 통신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기업의 존재 이유인 ‘적정 수준의 이윤 확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찾아내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어차피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요금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상황에서 통신업체들이 무작정 반발하기도 어려워졌다.
김희정(한나라당) 의원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인터넷ㆍ휴대폰ㆍ유선전화 요금 등을 모두 합친 월 평균 통신요금이 30만원에 육박한다”며 “통신요금이 전체 소득의 10%를 웃도는 이상한 구조를 개선할 종합대책이 이 기회에 나와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