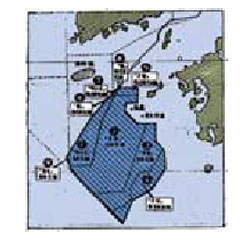|
1974년 1월30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2개 협정, 5개 부속문서로 이뤄진 대륙붕 협정의 골자는 제주도 남부 해역 공동개발. 분쟁의 초점이었던 영유권 주장을 서로 덮어둔 채 해저자원 공동개발에 합의한 것이다. 협정은 ‘7광구에서 기름이 솟을 것’이라는 꿈을 안겨줬다. 대륙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한 국제기구가 1968년 발표한 보고서 때문. ‘거대한 유전의 존재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우리 정부는 제주도 남쪽 8만㎢를 제7광구로 정하고 한국령으로 공식 선포했다. 거리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가까웠던 일본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양국의 대립 속에 1972년 일본이 뜻밖의 제의를 해왔다. 바다의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 50%씩의 지분을 갖자는 것. 일본이 태도를 바꾼 것은 당시까지 해저영토에 대한 지배적 이론이었던 ‘자연연장설’로 볼 때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기대와 달리 7광구에서는 원유가 쏟아지지 않았다. 몇 차례 미량의 유징이 발견됐을 뿐이다. 문제는 앞날이다. 50년으로 정한 시한이 만료될 경우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 유엔이 해양법협약(1982년)에서 지형(자연연장설)이 아니라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를 갈랐기 때문이다. 2024년이면 7광구의 권리가 일본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은 총리실 산하에 전담 연구소를 설치해 미래에 대비하는 반면 한국은 그나마 있는 부처마저 폐쇄하는 실정이다. 중국과의 대륙붕협정도 과제다. 서해에서의 탐사작업이 중국 군함의 위협으로 무산된 적도 있다. 중국과 일본의 공세로부터 수많은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해저영토 대륙붕을 지켜낼 수 있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