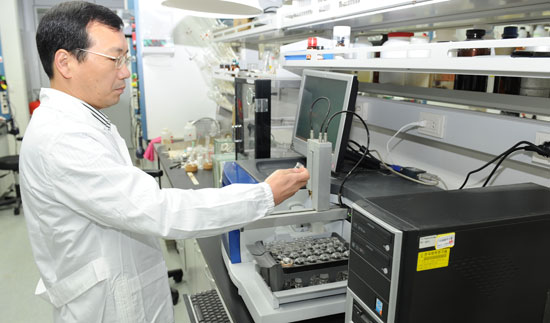홈
산업
산업일반
[화학으로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⑧ 환경친화형 작물보호제 신물질
입력2010.12.15 16:37:09
수정
2010.12.15 16:37:09
기존 제초제보다 소량으로도 약효<br>사람·가축에 무해 안전성 뛰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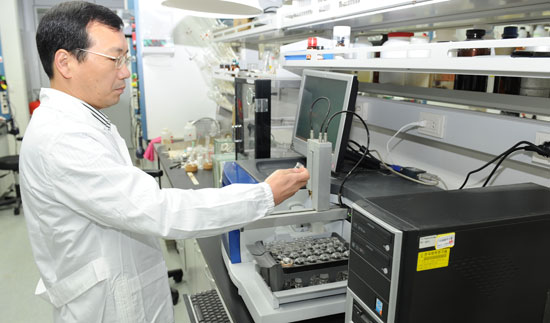 | | 고영관 한국화학연구원 박사팀은 독성과 환경 잔류성이 높은 기존 작물보호제의 한계를 극복한 환경친화형 작물보호제 신물질을 개발, 상업화하는 데 성공했다. |
|
지구촌 인구는 올해 70억명을 돌파한 뒤 오는 2050년이면 90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류는 이미 지구가 보유한 땅의 41%, 작농 가능 토지의 80%를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많은 학자들은 수십년 내 극심한 식량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작물보호제는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무기 중 하나다. 이를 사용해 잡초나 해충을 방제하면 농업생산성을 평균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농약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작물보호제는 독성과 함께 토양ㆍ수질 잔류성이 높아 그간 인간과 가축ㆍ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한계의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친화적 작물보호제 개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을 계기로 연구를 본격화한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소재연구센터의 고영관 박사팀이 그 선두에 위치한다. 지금껏 국내에서 개발된 6종의 작물보호제 신물질 중 효능과 상업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 받는 플루세토설푸론ㆍ메타미포프가 바로 고 박사팀의 연구 산물이다.
고 박사는 "작물보호제 원제 수입액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할 만큼 해외의존도가 심각한 실정에서 순수 국내기술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환경친화형 작물보호제 신물질을 개발해 상업화까지 완료했다는 데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두 물질은 각각 LG생명과학과 동부한농에 기술 이전돼 플럭소ㆍ일지매ㆍ만능손ㆍ하이킥 등의 브랜드로 출시됐으며 국내외 제초제시장에서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플루세토설푸론은 환경유해성 때문에 사용이 중단되기 전까지 제초제시장의 최강자였던 몰리네이트와 비교해 100분의1(15∼20g/㏊) 약량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 현재 중국ㆍ베트남ㆍ일본 등에서 물질특허 등록이 완료됐고 올해는 국내 작물보호제 중 최초로 일본에서 시판되며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메타미포프 역시 미국ㆍ유럽 등 15개국에 물질특허 등록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처음 중국에 출시되는 쾌거를 올렸다. 동부한농은 중국에서만 약 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물질은 각각 세계적 안정성평가기관인 영국 헌팅턴연구소, 스위스 RCC에서 만성발암성시험ㆍ환경독성시험 등의 평가를 거쳐 인체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공인 받았다.
그렇다면 이들 물질은 어떻게 약효와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을까. 고 박사는 "잡초의 엽록체 내에 존재하는 효소의 활동 억제에 비결이 있다"고 전했다. 플루세토설푸론은 ALS, 메타미포프는 ACC라는 효소의 활동을 막아 식물체의 생리활동을 관장하는 아미노산의 공급을 끊거나 세포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질 합성을 중지시켜 잡초가 고사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특정 잡초에만 영향을 줄 뿐 벼는 물론 사람과 가축에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는다.
고 박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작물보호제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서는 확고한 신물질 파이프라인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함께 산학연 컨소시엄을 꾸려 그린바이오기술에 기반한 3종의 또 다른 신물질 글로벌사업화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