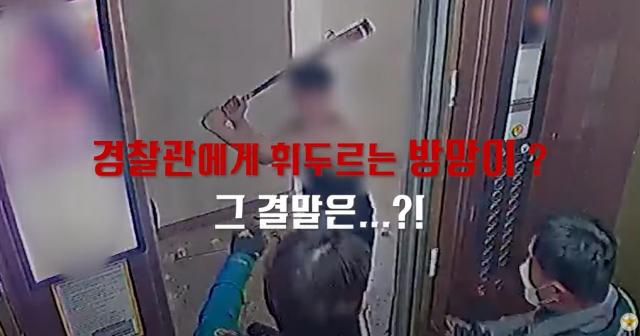중국산 김치에 이어 차에서까지 납 성분이 검출돼 온 나라가 시끄럽다. 중국산 제품이라면 ‘불량’ 혹은 ‘싸구려’ 이미지의 극치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한국발’ 보도를 접하는 중국인들의 반응은 되레 무덤덤했다. “중국보다 한국정부의 관리가 더 까다로울 텐데 이상하다”거나 천차만별인 농산물 중에서 “싸구려를 골라 사고파는 수출ㆍ수입 업자의 문제”라는 반응 정도였다.
알다시피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김치의 상당량은 한국인이 만든다. 우리 배추 종자를 가져다가 국내와 유사한 땅에서 재배해 서울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차 역시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 보따리 상들이 밀수해 판매한 것들이다.
요지는 ‘중국’ 자체라기보다는 ‘가장 저렴하게 농산물을 조달 가능한 환경’이 현재로서는 중국이라는 데 있는 것이다. 질 좋은 중국산은 일본ㆍ유럽 등이 거의 독점하고 한국 수입상들은 주로 가장 저렴한 농산물을 유입하는 경로로 중국시장을 이용한다.
때문에 중국인들은 생산자추적제를 도입하거나 원산지를 성 단위까지만 표시하더라도 불미스러운 사태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 국민이 중국에 눈을 뜰 때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다.
남한 면적의 90여배에 달하는 중국은 그 땅덩어리의 방대함 만큼이나 풍부한 물자로 유명하다. 콩은 원산지가 만주 땅이며 흑룡강성에서 생산 중인 유기농 쌀은 50% 이상을 ‘입맛 까다로운’ 일본인이 점유할 정도로 품질의 우수성을 자랑한다.
이밖에 내몽고의 메밀, 동북3성의 깨, 산둥반도의 신선 채소 등 각 성이 자랑하는 중국 농산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에 가깝다. 게다가 천혜의 자연환경과 막대한 생산물량, 저렴한 가격요건 및 중국정부가 1,000개 생태현 지정을 거의 마무리했을 정도로 ‘친환경’을 좆는 여건 등이 동북아시장이 하나 됐을 때의 파급효과를 내다보게 한다.
지난날의 마늘 파동에서 유추 가능하듯 ‘IT를 팔아먹고 살아야 할’ 우리에게 중국 농산물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부딪혀야 할 현실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중국산에 대한 경계의 뒷면에 이 같은 두려움이 내재돼 있다는 것을 그들 역시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신토불이’ 구호만이 우리의 대안이라면 ‘싸구려 중국산’에 대한 우려보다 더 큰 우려가 이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