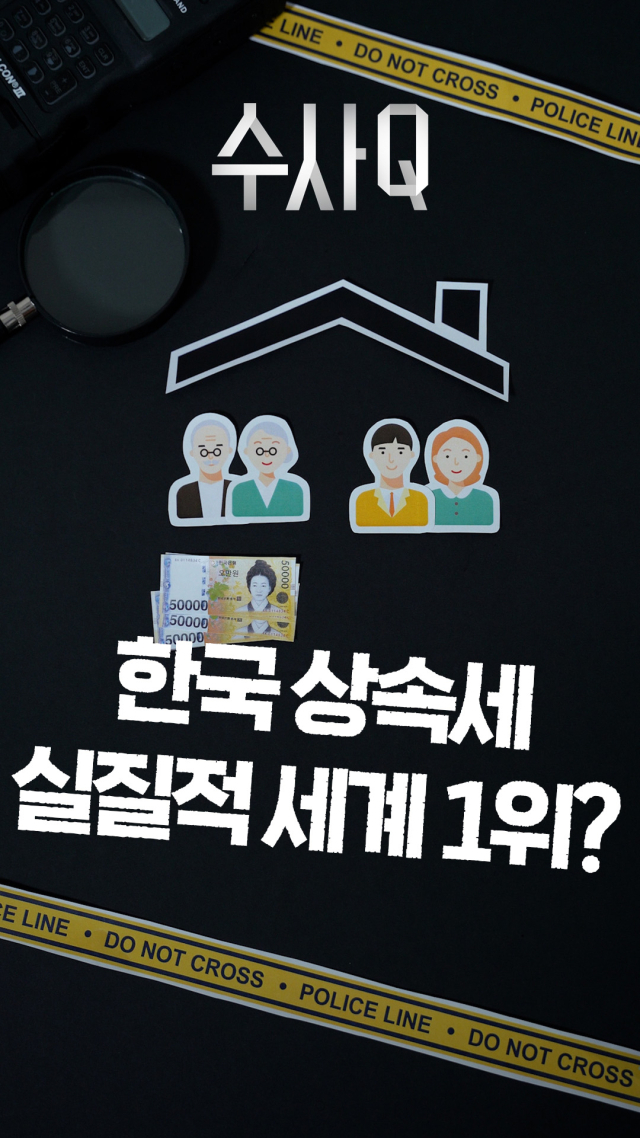홈
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대기업 지탄이 능사일까
입력2011.04.28 18:22:38
수정
2011.04.28 18:22:38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이를 두고 이런 저런 말이 많다. 식품분야에 한정해서 보면 두부ㆍ고추장 등의 품목이 들어가게 돼 관련 대기업의 반발이 거세다.
그런데 어떤 업종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떠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영위해야 할 업종은 각각 따로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찬성하는 부류들은 그간 대기업이 자본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나서 중소기업의 영역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산업계도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되고 있어 같이 커가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바탕에 깔렸다.
적지 않은 대기업이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을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하인 부리듯 하는 국내 산업계의 오랜 악습을 감안하면 동반성장이라는 대의명분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덩치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금 긋듯 하는 발상은 동의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런 발상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례로 만약 두부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최종적으로 들어가 포장 두부 시장의 90% 가까이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CJ제일제당ㆍ풀무원ㆍ대상이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두부 시장에는 영세 업체만이 남게 된다. 이런 가내 수공업 수준의 업체들이 과연 커질 대로 커진 두부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소비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제품의 질을 제대로 맞추기도 버거울 듯싶다.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더 심각하다. 정부는 입버릇처럼 내수에 치중해온 식품기업들에게 해외로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대기업이 배제된 시장에서 제대로 된 경쟁 없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통할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몇몇 업종을 정해 중소기업에만 문호를 열겠다는 발상은 구체화하기에는 실타래처럼 얽힌 현실적 문제가 너무 많고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지극히 안일한 해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