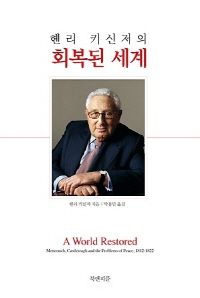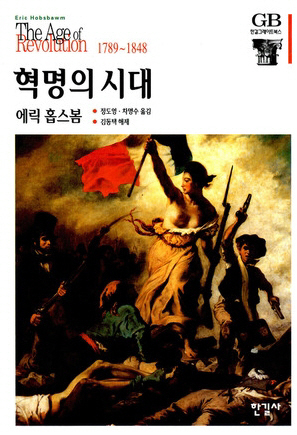|
|
|
역사학에서 시대구분은 학문의 시작이자 종결점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폴 존슨은 이 책 '근대의 탄생'에서 서양의 근대, 백인특유의 관점으로 확대해석하자면 세계사의 근대가 19세기 초에 시작됐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학계의 주류 의견과는 다르다. 지금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여러 영역을 형성한 '근대'는 보통 18세기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근대적 개인이 등장한 시기가 18세기라는 점에서다.
이런 주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릭 홉스봄이다. 홉스봄은 18세기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을 이중혁명으로 본다. 전자가 생산방식을 농업과 수공업에서 공업과 기계로 바꾼 경제혁명이었다면, 후자는 절대왕정으로 상징되는 구체제(앙시앙 레짐)를 종식시키고 국민주권에 입각한 정치혁명이었다.
다만 공산주의의 해체, 냉전의 종식과 세계체제의 다극화와 함께 다양한 학문적 연구의 심화는 이런 이중혁명의 '신화'에 메스를 가하고 있다. 사회진보와 절대선이라고 여겨졌던 프랑스대혁명이 인민에 대한 재난을 초래한 측면도 있었고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생각만큼 생산방식의 변화가 혁명적이지는 않았다는 인식에서다. 근대라는 시대가 특별히 하루아침에 탄생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의미다.
폴 존슨이 19세기에 주목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다. 이제까지는 1815년 이후 '빈 체제'는 프랑스대혁명이라는 진보를 뒤엎는 복고주의라는 선입견이 강했다. 하지만 앞서처럼 혁명의 신화가 흔들리면서 '빈 체제'가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이다.
'빈 회의'를 통해 마련된 이 체제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 100년간 유지됐다.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나오면서 흔들렸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민중의 대두와 세력균형이라는 관념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대' 기점으로 산업혁명과 프랑스대혁명을 내세우는 학자들은 프랑스를 주축으로 미국 쪽의 학자들이 많다. 이중혁명은 어쨌든 프랑스대혁명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영국학자들을 중심으로 19세기 '근대'가 주장되고 있다. 19세기는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기 시작한 것이다. 국적에 따라 연구의 관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재미있다.
한편 '근대'의 시작과 관련해서 함께 읽어볼 책으로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역임한 헨리 키신저의 '회복된 세계'가 있다. '빈 회의'를 전후한 유럽의 정치사를 실감나게 그려냈다. 장기적인 개념으로 근대를 주장한 것은 에릭 홉스봄의 '혁명의 시대'ㆍ'자본의 시대'ㆍ'제국의 시대'ㆍ'극대의 시대'등 4부작과,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근대세계체제(1~3)'가 있다.
서양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가를 분석한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ㆍ균ㆍ쇠'와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르네상스가 근대의 시작이라는 스티븐 그린블랫'1417년 근대의 탄생'도 읽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