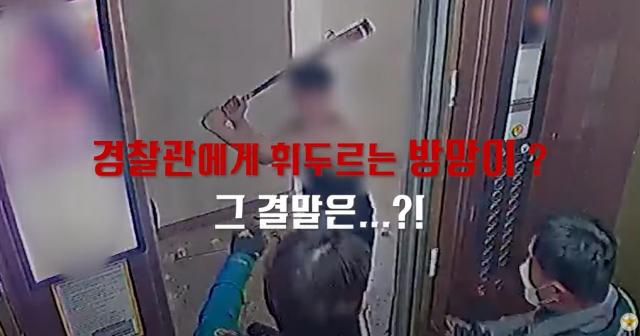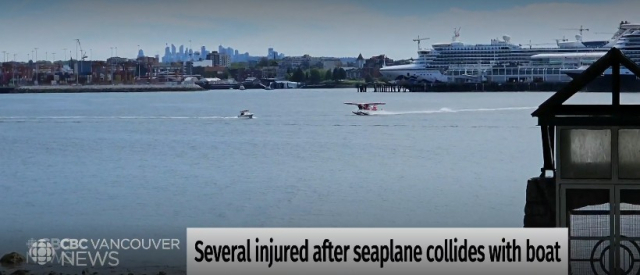“정해진 대로 받았을 뿐인데 답답합니다.”
18일 기업은행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행원들이 지난해 경영평가에 따라 월 기본급의 27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각각 200%와 150%의 성과급을 받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비난의 근거는 금융위기가 다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 잔치’를 했다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생각은 공기업 특히 금융공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입관에서 나왔다. 선입관의 주된 내용은 ‘하는 일은 없는데 고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고임금이면서 안정적인 이들이 400~85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겼으니 배가 아프다는 얘기다.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 낭비적인 요소는 최대한 줄이고 지나친 성과급 등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니까 무조건 적게 받고 성과급도 최대한 적게 줘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이날 논란이 됐던 기업은행은 기관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275%를 받은 것이다. 275%라는 숫자는 정해진 수치로 최고 등급이라면 275%를 받게 돼 있다. 예를 들어 ‘A등급’이라면 약 250%를 받는 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다. 정해진 원칙을 따른 것뿐인데 이들을 싸잡아 문제 삼는다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기업 성과급제는 오히려 폐지하는 게 옳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적게 주고 아껴쓰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 올 들어 공공기관장들의 기본급은 차관 수준인 1억1,0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공기업은 이보다 낫지만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초라한 수준이다. 돈은 적게 받으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직장일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돈을 적게 줘서는 안 된다. 탤런트 배용준의 몸값이 논란이 됐을 때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는 “수백억을 주더라도 그의 몇 배를 벌어온다면 충분히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공공기관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에 맞는 경영성과를 요구하는 게 올바른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