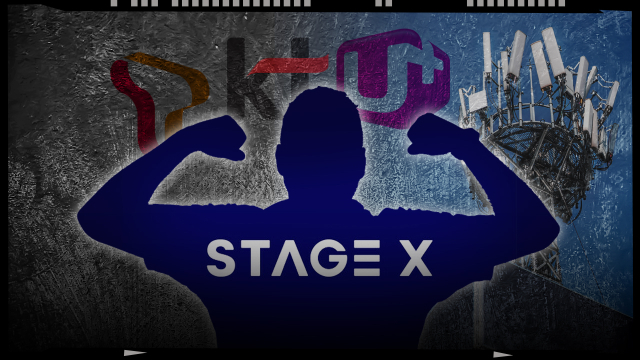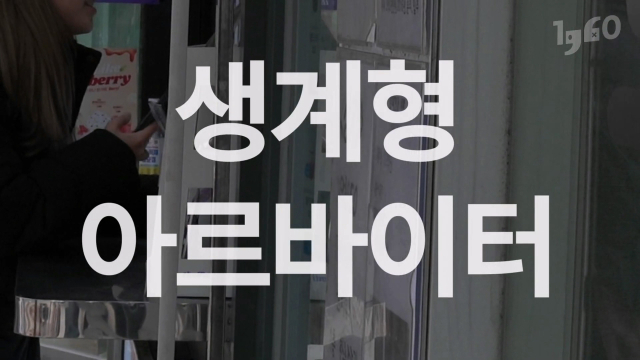「부익부, 빈익빈」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생명보험업 구조조정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고객이 튼실한 회사로만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교보, 대한 등 이른바 「빅3」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80%를 넘보고 있다. IMF와 구조조정이란 강풍 속에서도 오히려 저력을 키워가고 있는 셈이다.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분석한 6월중 29개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3조1,554억원. 이 가운데 빅3가 74.2%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들 3개사의 지난해 12월말 현재 시장점유율은 65% 수준이었으나 불과 6개월만에 9.2% 포인트나 시장을 늘린 것이다.
◇구조조정 언제 끝나려나= 보험산업 구조조정은 외환위기의 태풍이 몰아친 지난 97년 이래로 여전히 진행중이다. 언제 끝날지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8월, 4개 부실 생보사가 간판을 내린데 이어 조만간 다른 보험사에 매각되거나 청산되는 5개 회사(동아·태평양·한덕·조선·두원)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모두 9개 생보사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한때 33개에 이르던 생보사 가운데 이제는 24개 기업만이 살아남게 된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보험시장이 20개가 넘는 생보사를 흡수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좁은 국내시장을 놓고 머리 터지는 경쟁을 치르다보면 또다시 사망(퇴출)과 부상(인수합병)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구조조정은 2000년 벽두에도 여전히 강풍으로 몰아칠 전망이다.
◇과열경쟁 시대의 종말= 인구 5,000만명도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생보사들의 수가 30여개까지 늘어났던 것은 과거 정부가 이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데 따른 것. 「돈깨나 있다」는 기업들은 지난 80년대말, 너나없이 생명보험업에 뛰어들어 혈전을 치러왔다.
『남들이 의욕적으로 달려들길래 큰 돈이 될줄 알았죠. 최소한 계열사나 협력업체 식솔들만 보험을 들어도 그럭저럭 굴러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원들도 「보험을 하자」고 설쳤구요. 그런데 뒤늦게 들어간 보험사업 때문에 회사가 거덜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조업체를 남부럽지 않게 경영하다 후발 보험사를 설립, 금융사업에 진출했으나 IMF 직후 「그룹 공중분해」라는 비운(悲運)을 맞이한 한 기업인의 말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분위기에 휩쓸려 보험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알짜가 돼야 살아남는다=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선 「퇴출통로」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뒤늦게 보험사업에 진출, 월간 수입보험료가 2억원에 불과해도 그럭저럭 계열사 지원을 받아가며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질서를 통한 「자동퇴출구」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경쟁력없는 생보사는 수시로 아웃(OUT)당하게 됐다.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유럽연합(EU) 방식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급여력이란 고객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을 경우를 대비해 준비금으로 쌓아놓는 것을 말한다.
생보사들은 지금부터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 금액을 지급여력 기준으로 나눈 것)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익을 내거나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기준에 맞춰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이 기준 이하인 보험사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일정기간 이후에도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퇴출당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생보사들의 경영 패러다임이 과거의 「규모경영」에서 「내실경영」으로 급속히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의 외형이 다소 작아도 한편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을 잘 운용한다면 21세기에도 「알짜배기 보험사」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상복기자 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