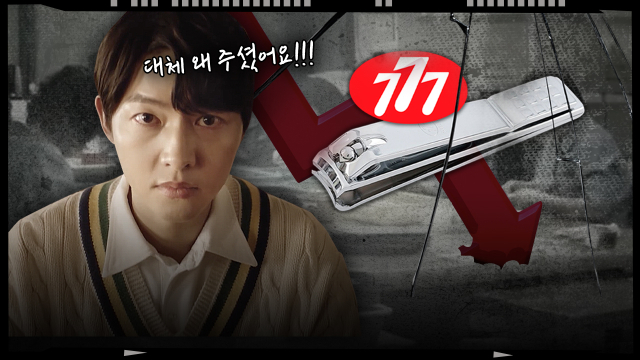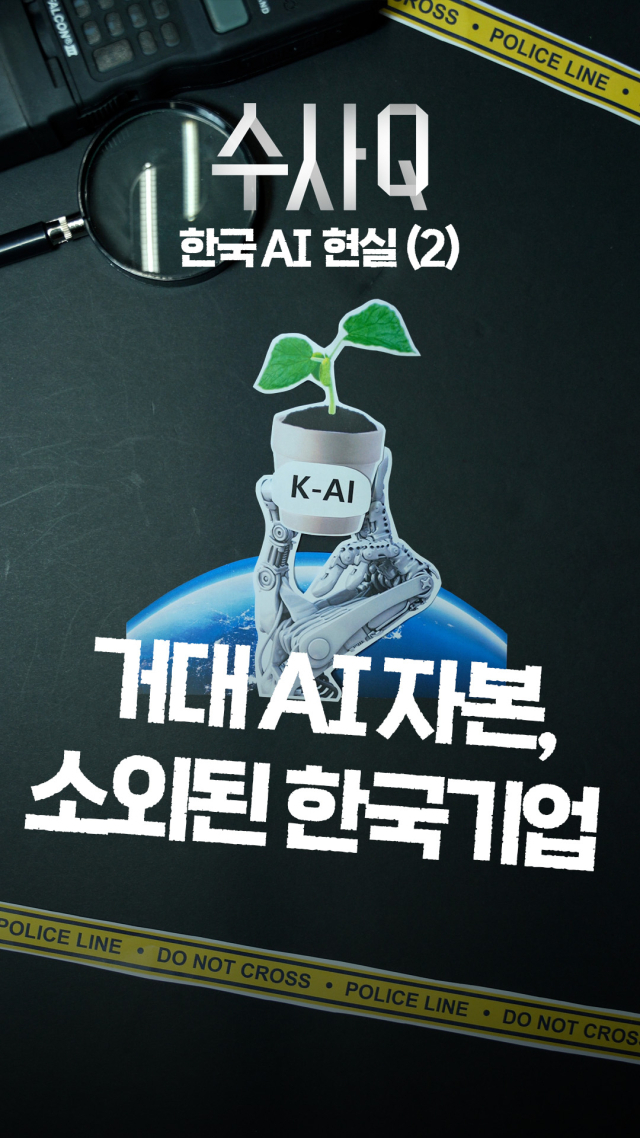최근 중동에는 넘쳐나는 오일머니에 힘입어 건당 수백억달러짜리 대형 프로젝트가 쏟아지는 등 '제2 중동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충분한 기술경쟁력을 갖추고도 외국 경쟁사에 비해 금융조달 능력에서 한참 뒤져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자금조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해외 PF의 파워를 키우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해외 플랜트 분야는 지난해 사상최대인 650억달러의 수주실적을 올릴 만큼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특히 유럽 은행들이 재정위기와 바젤Ⅲ 기준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지금이야말로 우리로서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호기다.
해외 PF가 제대로 자리잡자면 무엇보다 중동계 자금의 적극적인 유치가 중요하다고 본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금리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는 만큼 세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는 중동자금과 결합한다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유자산만도 1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중동 국부펀드 유치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국회의 벽에 부딪혀 무산됐던 이슬람채권 도입 문제도 대승적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돼야 한다.
시중은행들도 이제 덩치가 커진 만큼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해외진출 기업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각국의 사업 특성에 맞춰 수주단계부터 철저한 금융자문을 제공하고 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시장 진출도 지역이나 업종별로 다변화해야 할 때다.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거점을 꾸준히 넓혀가고 기존 시장의 점유율을 지켜가면서 태양광 등 에너지나 신재생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