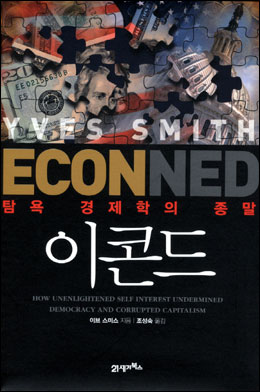|
25년 가까이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한 저자가 70년 경제사를 들여다본다. 자유시장 이론은 어떻게 맹신의 대상이 됐을까. 저자는 이 같은 물음을 던지며 경제학자의 착각과 금융업자의 탐욕이 빚어낸 오류를 시대순으로 짚어낸다.
저자는 특히, 칠레의 사례를 들어 무분별한 자유시장 체제 강요가 어떤 경제적 파급을 초래했는지 보여준다. 그는 "자유시장 추종자들이 칠레를 모범 사례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이 가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잔혹한 독재자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꼬집어 말한다. 1973년 칠레는 피노체트가 정권을 잡으면서 무역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공공지출의 대규모 삭감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칠레는 막대한 부채에 허덕였다. 은행들이 저리의 외환 대출을 제공하자 칠레의 경제 거품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1981년 거품이 폭발하며 부실 채무로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대거 줄였다. 1982∼1983년 동안 GDP가 크게 줄어들었고, 제조업 산출량은 28% 가량 떨어졌으며 실업률도 20%까지 치솟았다. 현재 칠레는 소득격차가 급격한 나라들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저자는 "자유 시장 경제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은 금융위기의 바람이 불어 닥칠 때마다 칠레가 걸어간 경기 하강의 전철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가 책 전반에 걸쳐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다. 이미 실패한 이론에 미련을 두지 말고, 잘못된 경제 이론의 권위에 눌려 바르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잃지 말라고 말한다. 경제 소식에 민감한 개인과 정책 입안자들은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경제학자들의 책과 논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경제의 많은 부분을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만큼 우리는 그 전문가들에게 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놓았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할 책임이 있다.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콧대를 높이며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기를 피하는 경제학자는 돌팔이나 다름없다. 저자는 "경제학에서 인간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존재, 즉 '이콘(Econ)'으로 정의하는 만큼,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론에 흔들리기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라"고 조언한다.
이론 역사서에 가까워 가독성이 뛰어나진 않지만, 금융위기와 경제 이론의 인과관계를 짜임새 있게 설명하는 책이다. 3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