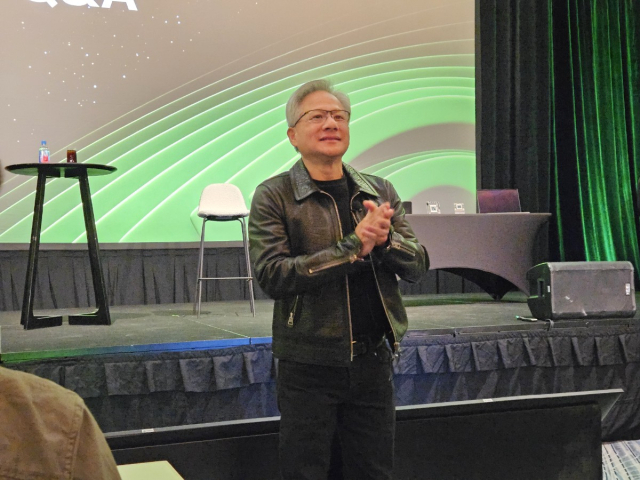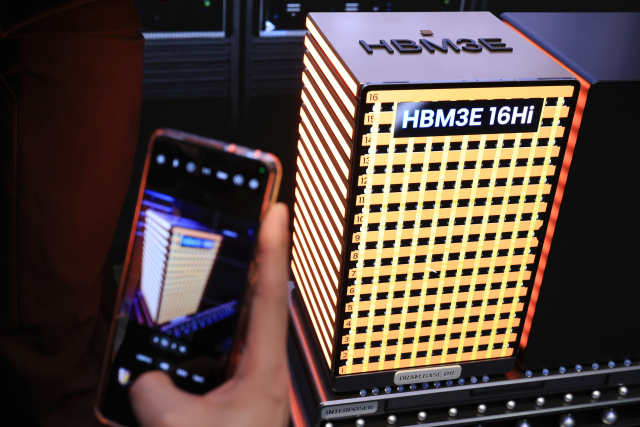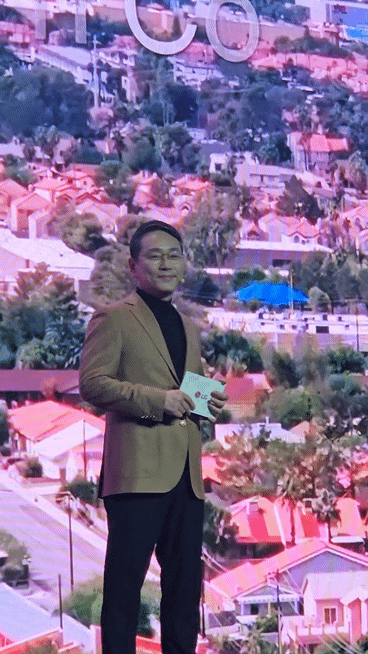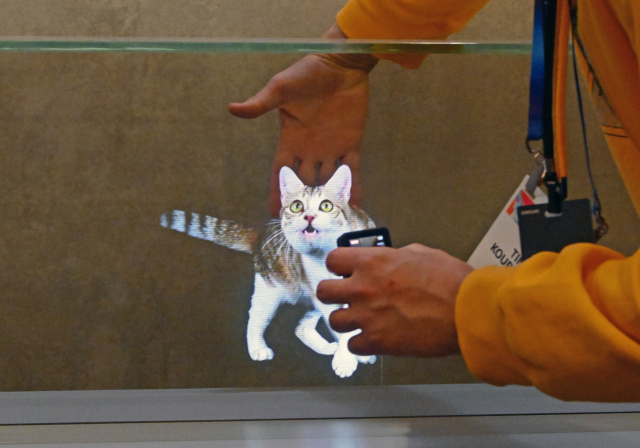문학 속의 서울<br>김재관ㆍ장두식 지음, 생각의나무 펴냄
서울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이국적인 풍경 하나를 들라면 한강 변에 죽 늘어선 아파를 첫 손에 꼽는 이가 많다. 더욱이 공항에서 서울 도심 한 복판까지 한강을 따라 사열하듯 줄 맞춰 우뚝 선 그 아파들이 한 채 십수억원을 호가한다는 말을 들은 외국인들은 적잖이 놀란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도로 1960년대초 처음 등장한 아파트.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 힘든 서울시의 모습을 설명할 때 아파트는 이제 빼 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자리잡았다. 한국전쟁 이후 문학 작품 속에서도 아파트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은유와 상징이다.
서울문화재단이 기획한 서울문화예술총서의 두 번째 시리즈인 '문학 속의 서울'은 40여 년 간에 걸친 서울 시민들의 삶을 50여편의 문학 작품들을 통해 복원했다. 문학 작품 속에서 서울이라는 복잡 미묘한 도시를 해부하기 위해 아파트라는 칼날을 꺼내든 젊은 학자들의 시선이 매섭다.
조세희의 '민들레는 없다'라는 소설 속에서 저자들은 "시멘트와 철근이 없으면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뭉치지 못하는 그런 동네"라는 인용문을 통해 서울을 "공동주택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단절성과 익명성"의 공간으로 묘사했다.
자신의 아파트에게 소외당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변해버린 사내를 등장시킨 최인호의 '타인의 방'에서는 "국가와 제도, 직장과 가정, 심지어는 자신이 기르는 애완견에게도 종속되어 또 다른 사물로 살아가는 서글픈 현실이 우화적으로 형상화"된 곳으로 서울을 정의한다.
1970~80년대 서울 소시민들에게 내 집한 채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는 박영한의 '지상의 방 한 칸'과 신상웅의 '도시의 자전' 등을 통해 되새겨 본다.
초거대 도시의 발전한 서울의 모습을 들춰내기 위해 저자들이 동원한 해부도(解剖刀)는 아파트 만이 아니다.
저자들은 개발 논리에 밀려 헐려나가는 달동네(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떠나는 이들의 이별 공간으로서 김포공항(박완서 '이별의 김포공항'), 샐러리맨들이 하루의 시름을 풀어놓는 포장마차와 선술집(신상웅 '포장마차',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녹아 있는 가리봉 시장(양귀자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과 90년대 욕망 배출구의 상징이었던 압구정동(이순원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등 다양한 렌즈를 통해 6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숨가쁘게 50여년을 달려온 서울의 역사를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