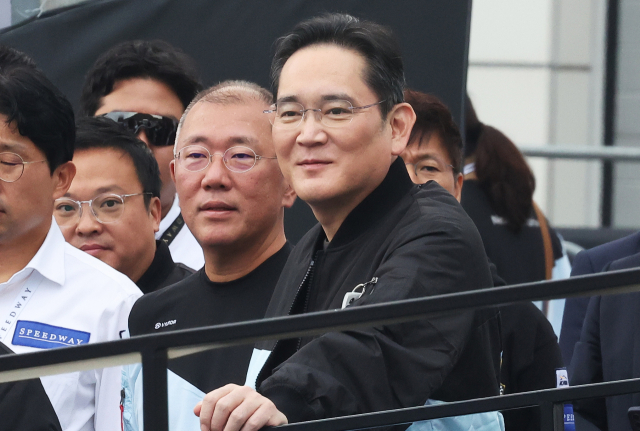최근 탤런트 A양이 호텔서 납치돼 연일 언론에 오르내릴 때 광고업계에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당시 신문과 방송이 연예인 A양 사건에 관심을 갖고 보도 경쟁을 벌이자, 광고 업계에는 때 아닌 `비상 경보`가 울렸다. 광고 대행사로서는 행여 자신들이 대행하는 광고 모델이 이번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는지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
회사 이미지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미지가 허물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업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한 광고 대행사 국장이 당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 기자 혹시 그 연예인이 누군지 알고 있어?”라며 확인을 요청했을 정도다.
문제는 이러한 해프닝이 연예인 스캔들이 터져 나올 때 마다 매번 광고업계에 반복된다는 점이다.
국내 광고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4,000여억원을 넘었고, 질적으로도 매년 유수의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할 만큼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 있다.
그러나 연예인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내 광고업계는 톱 스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한계를 보인다.
이는 광고 대행사들의 아이디어 빈곤에서 비롯되는데도, 대행사들은 `광고주가 톱 스타를 원하는데 특별히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크리에이티브(독창성)`가 생명인 광고 대행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부하지 않고 `스타 시스템`에 집착하고 있어 일종의 `직무 유기`라는 비난 여론도 제기될 정도다.
물론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톱 스타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광고 대행사들은 톱 스타 캐스팅보다는 기발한 카피 문구에 머리를 쥐어짠 결과, 종종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원로 배우인 신구씨가 유행시켰던 `니들이 게 맛을 알아`라는 카피 문구와 수억원의 몸 값을 자랑하는 톱 스타 중 어느 편이 일반인들 뇌리에 더 깊이 각인될까.
광고 속에 `크리에이티브`가 담겨 있을 때, 한 광고가 그 사회의 문화가 되고 나아가 예술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본다.
<안길수기자(생활산업부) coolas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