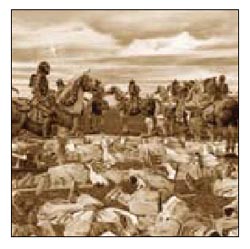|
‘흡사 봄놀이 같았더라.’ 서애 유성룡이 ‘징비록(懲毖錄)’에서 묘사한 남도근왕군(南道勤王軍)의 행군 모습이다. 그럴 만했다. 한양을 버리고 피신 중인 선조를 구원한다는 열정과 달리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농민들이었으니까. 남도근왕군의 출발점은 조선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물산이 풍부했던 호남. 관리들이 고을을 돌며 장정 4만여명을 모았다. 보급품을 실은 수레의 행렬이 50리 길에 가득 찰 정도의 세력이었지만 문제는 경험 부족. 농민 일색의 병사에 지도부도 문관 일색이었다. 광주목사로 참전한 권율도 이때까지는 평범한 문관이었다. 오합지졸이었지만 남도군사들은 가는 곳마다 환영 받고 세를 불렸다. 나라를 구할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북진 중에 충청도 병력 8,000여명이 가세하고 쑥밭이 돼버린 경상도에서도 살아남은 무관들이 힘을 보탰다. 하삼도(下三道)의 군대는 수원성에 무혈입성한 후 왜군 십여명의 수급을 베는 작은 성과도 거뒀다.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난 것은 1592년 6월5일. 용인 부근의 보급기지 겸 망루를 지키는 600여명의 왜군이 쏘아대는 조총에 막혀 진군하지 못한 채 점심을 먹고 있던 순간 한양에서 내려온 증원군 1,000여명이 합세한 왜군 1,600여명이 기마대를 앞세워 짓이겨오자 모든 게 끝났다. 전투로 죽은 병사보다 도망치다 밟혀죽은 병사가 많았다. 이튿날 근왕군은 뿔뿔이 흩어졌다. 조선의 근왕군에도 기회는 없지 않았다. 지도부가 독선에서 벗어나 무관들이 건의한 대로 병력을 분산 배치하고 한양 진격을 서둘렀다면 임진왜란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을지도 모른다. 민족사를 통틀어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의 하나인 탓에 교과서에도 제대로 오르지 않는 용인전투의 치욕은 과거사일 뿐일까. 무능하고 독선에 빠진 지도자는 대세를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