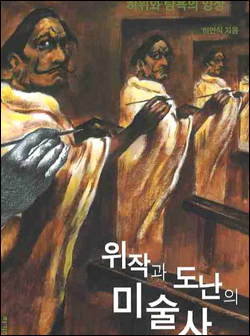위작과 도난의 미술사<br>이연식 지음, 한길아트 펴냄
1911년 8월 21일 프랑스의 자랑거리인 루브르 박물관이 발칵 뒤집혔다.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했던 이탈리아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인 ‘모나리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2년만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이전에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던 모나리자는 급기야 세계적인 명화의 반열에 올랐다.
미술품 도난은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길다. 미술품을 훔치거나 혹은 약탈하는 행위는 과거 정복자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활용됐지만, 오늘날은 주로 돈이 목적이다. 피카소, 반 고흐, 등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화가라면 한번쯤 작품을 도난당하는 곤혹을 치른 건 미술계에서는 적잖이 있는 일이다.
또 다른 미술계의 범죄인 위작은 어떤가. 렘브란트가 남긴 1,000여점의 작품 중 그가 직접 그린 작품은 200여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혀 지는 등 엄청난 돈이 걸린 미술관련 범죄는 언제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다. 미술시장이 커지고 있는 최근 한국에서도 이중섭ㆍ천경자 등 근현대 유명 화가들의 위작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책은 국내외 미술계를 뒤흔들었던 위작과 도난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미술계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미술에서의 위작과 도난의 역사는 미술에 대한 기만과 폭력의 역사”라며 “위작 사건은 시장을 뒤흔들 듯 해 보이지만 되래 미술품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아이러니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책은 단순한 사건나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자료조사를 통해 미술사와 연결된 사건을 추리소설 쓰듯 흥미진진하게 전개해 나간다. 작가이기도 한 저자는 그림을 그리는 경험을 살려 미술품 감식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하며 진품과 위작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