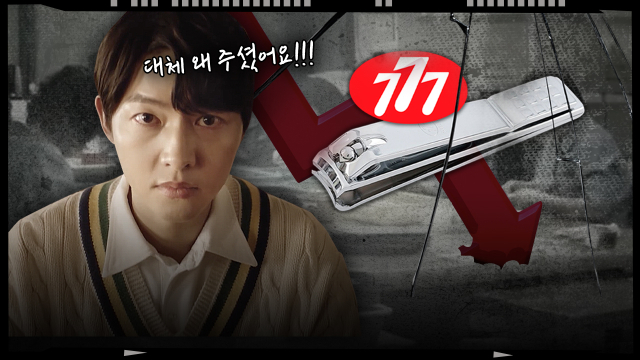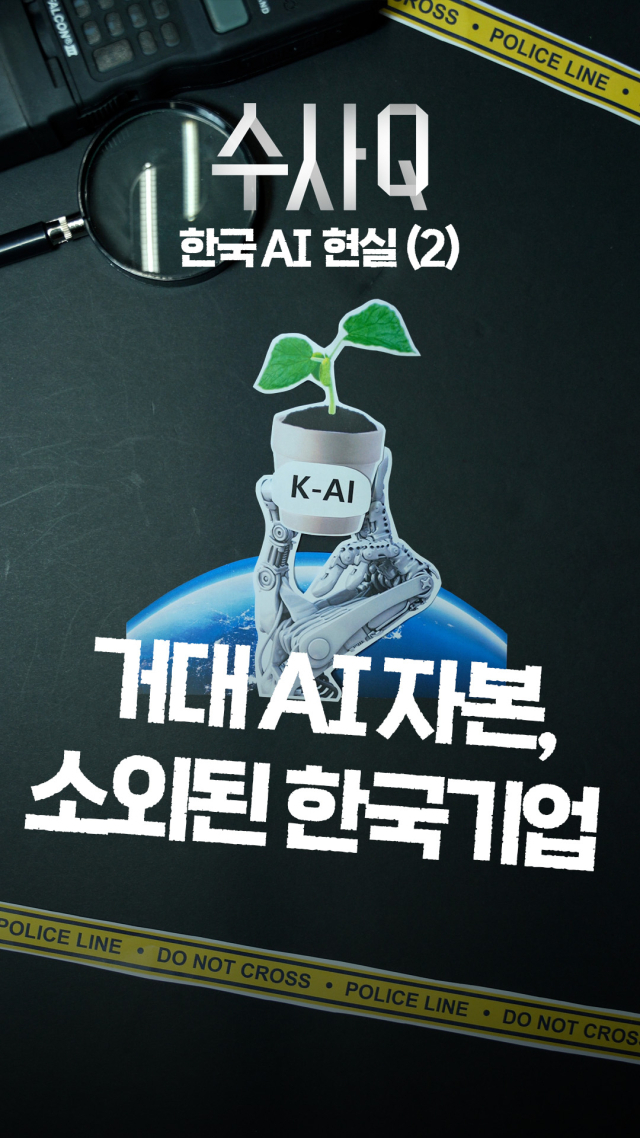일부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인상이 잇따르고 있어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있던 기업들이 더 이상 원자재 가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가격인상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자물가가 4개월째 4%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가격인상 러시는 물가불안을 더 증폭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도시가스 및 식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서민생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유와 일부 식품의 경우 가격인상폭이 8~10% 에 이르고 있다. 이들 제품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동안 국제원자재 가격은 큰 폭으로 뛰었는데도 정부의 가격억제정책에 눌러 제품가격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이 시급하지만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도 커진다는 점에서 언제까지 가격을 누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정부도 상반기 중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던 도시가스 요금을 원가상승 요인 반영을 이유로 올렸고 전기요금도 오는 7월 인상할 방침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가격통제가 한계에 부딪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과제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는 것을 전제로 물가안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급등세를 보인 농산물 가격이 최근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 물가불안 요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에서 안정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행정력을 동원한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오히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격급등으로 이어져 시장에 혼란을 주고 물가안정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양돼야 한다. 앞으로 물가안정은 가격기능에 의한 수급조절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필요하다면 금리인상을 비롯한 거시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용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의 경우 무리하게 금리인상 등 긴축에 나설 경우 물가와 성장 둘 다를 놓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