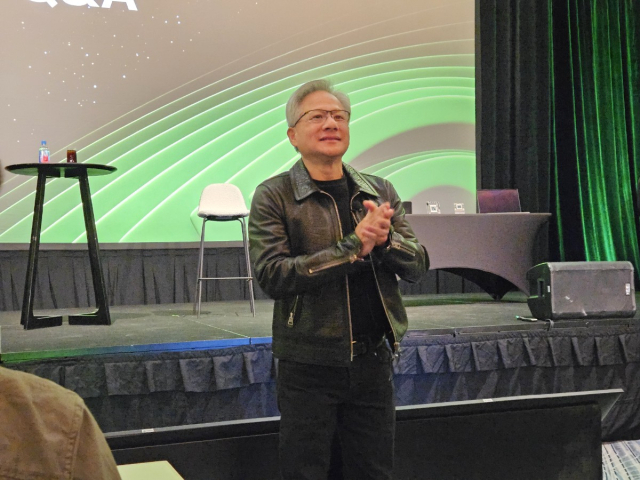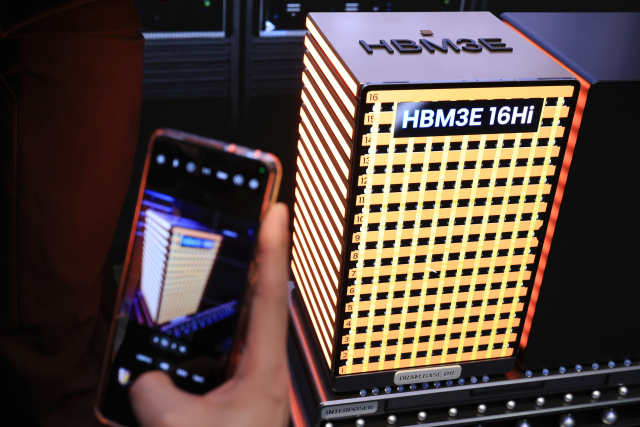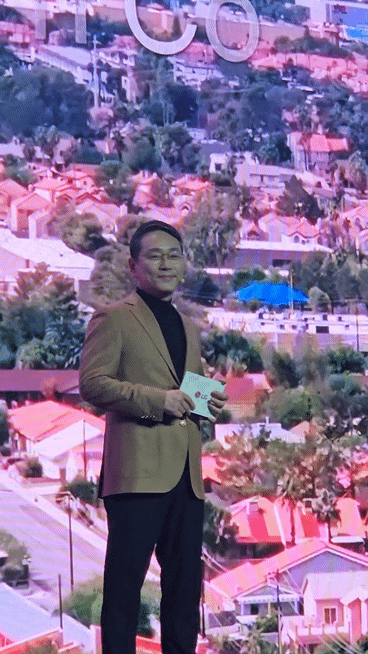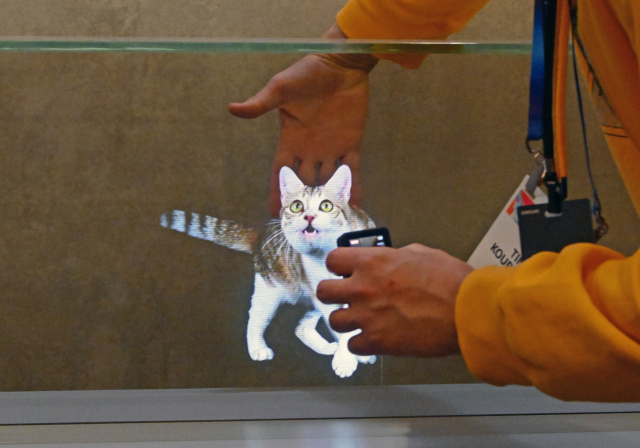|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 기획이 논술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어우러지는 공론의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관련 당국자와 대학,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이 논술을 바라보는 시각의 편차는 상당했고, 3자는 그 같은 입장에서 쉽사리 물러날 것 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일선 교사들과 대학의 주장을 따로 싣지 않는 것은 이 기사로 개개인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그들이 떠 안아야 할 부담이 상당해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터뷰에 응한 송성근 선생(34)은 5년째 대치동의 조동기국어논술학원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논술전문 강사임을 밝혀둔다.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 문제의 트렌드에 대해 말해달라. “논술강의는 98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05년까지 무척 어려운 논술이었다. 심지어는 대학원생들이 보는 교재에서 지문이 출제되기도 했다. 2005년 서울대에서 통합 교과형 논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논술 반영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현재로서는 통합형 논술은 제시문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문제도 통합형 냄새가 많이 난다.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논술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논술이 요구하는 논리력ㆍ사고력ㆍ창의력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증대가 요구되는 사회적 추세와 맞물려 있다. 논술시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방식의 지식구성 능력을 묻는 형태다. 이를테면 국어에는 하나의 어휘가 빈칸에 들어가지만 논술은 다양한 어휘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것이다” -대학이 제출하는 논술문제의 난이도가 적정하다고 보나. “통합교과라는 차원에서 대학들이 논술문제를 교과서 수준에서 출제하겠다고 하지만 다소 어려운 느낌이 든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칸트 5줄이 나온다고 해서 논술에 칸트를 낸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다. 개념의 단면을 잘라 가르치는 것이 고등학교 과정이라면 대학은 종합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수험생은 교과서 지식을 통시(洞視:꿰뚫어 봄)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학원에서는 논술을 어떻게 가르치나. “아마도 변화하는 논술 교육에 적응력이 제일 빠른 것은 사설 학원들 일 것이다. 입시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바로 적응한다. 시험이 바뀌면 채점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게 문제의 틀을 만들어나간다. 대학과 학생들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과학성을 추구해서 문제 유형을 분류하고 만들어 내거나 채점 항목을 만들기도 한다. 아이들의 개성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요약을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도 있다. 아이의 창의력이 어디로 튀어나가는지를 살펴보기도 한다. 논술 문제를 여러 번 풀게 하고 채점해 보면 아이들의 능력이 그래프로 그려진다.” -학생들이 논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읽고, 쓰는 것을 즐기고, 그 규칙들을 익혀야 한다. 그 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들이 스스로 재미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자기를 드러내는 즐거움이 우선 해야 한다는 말이다. 거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독서를 하고 토론이나 정리를 통해 피드백을 해야 한다. 그래야 체계화 할 수 있다. 중등부에서는 지적이 욕구들이 생기는 시기니까 논술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에 앞서 글쓰기는 초등학교 연장선 상에서 틀을 잡아주고, 감성중심의 지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독서와 작문을 가르치면 인성교육이 된다.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때는 실전 논술로 들어가야 한다. 형식을 가르쳐 주고, 꼴라주 기법을 가르쳐야 한다. 답안을 읽고 자기나름대로 글을 써봐야 한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원들이 이윤추구를 한다고 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은 지양해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