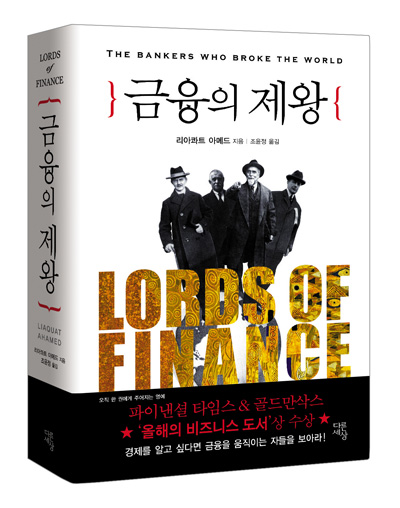■ 금융의 제왕 (리아콰트 아메드 지음, 다른세상 펴냄)<br>[전문가 리뷰] 과거 美·英등 총재들의 금본위제 맹신이 파국 초래<br>중앙은행 이론·현실 차이 느낄수 있는 기회 삼아볼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달라진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 하나는 사람들의 자신감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에 관한 절대적인 신앙심은 사라지고 난해한 금융공학을 향한 믿음도 증발했다. 그 대신 80년대 이후 벽장 속에 내팽개쳤던 케인즈를 재발견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한동안 거추장스럽고 야만적으로 여겼던 정부의 완력과 몽둥이를 믿는 경향이 커졌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위험이 따른다. 정부의 힘이 잘못 사용되면, 관치금융이 된다는 점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많은 문제이기도 하다.
유래 없는 경제난국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현실부정과 음모론도 위험하다. 지난해 널리 읽혔던 쑹홍빈(宋兵)의 '화폐전쟁'이 그 예다.
4대 문명권 중에서 유일하게 금본위제도를 실시한 경험이 없고, 세계 최초로 종이돈을 썼던 중국에서 금본위제도가 추앙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금본위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 책에 매료된 사람(특히 경제전문가들)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전세계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순진하게만 들린다. 음모론이나 현실도피의 또 다른 형태다.
금본위제도에 대한 환상을 말끔히 깨뜨려 주는 책이 발간되었다. 바로 리아콰트 아메드가 쓴 '금융의 제왕'이다. 지난해 해외에서 격찬을 받은 이 책에서 저자는 금본위제도의 위험을 방대한 자료와 집요한 인물탐구를 통해 여실히 보여준다.
제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격랑 속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들이 가졌던 금본위 제도에 대한 신앙심이 어떤 파국을 초래했는지 생생하게 펼쳐진다. 대공황은 바로 이들의 잘못된 신앙심의 결과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그리고 나서 금본위제도를 '야만의 유산'이라고 주장했던 젊은 케인즈의 고독한 투쟁에 박수를 보낸다. 참고로 저자는 세계은행 출신이고 케인즈는 세계은행 탄생의 산파역할을 했다.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들은 꽤 두꺼운 책을 읽는 부담감을 크게 줄여준다.
저자는 과거 막강했던 중앙은행 총재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결국 중앙은행의 힘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구제금융안 통과를 위해 당시 폴슨 재무장관이 팰로시 하원의장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반면 미 연준은 소문 없이 1조 달러의 돈을 풀었다. 그것이 중앙은행의 힘이다. 금본위제도라면 어림없는 이야기다.
미국은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버냉키 현 연준 의장의 연임이라는 현상유지정책을 결정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7일 '10년 만에 한은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라는 놀라운 카드를 발표했다.
3월말에는 현 한은 총재의 임기가 끝난다. KB 회장 보다도 훨씬 중요한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정책을 펼지 관찰하는 것은, 이 책의 독자들이 중앙은행에 관한 글로벌 이론과 로컬 현실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