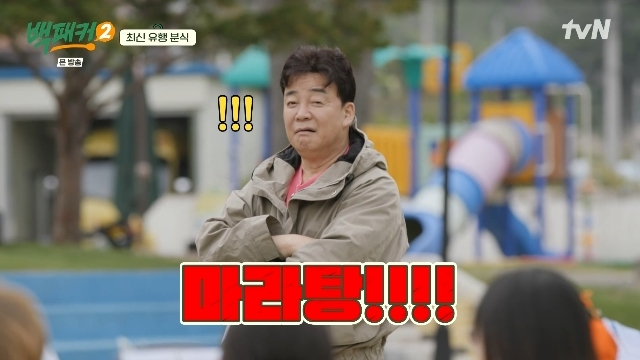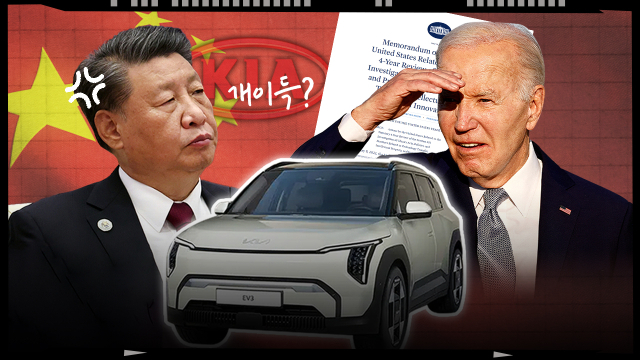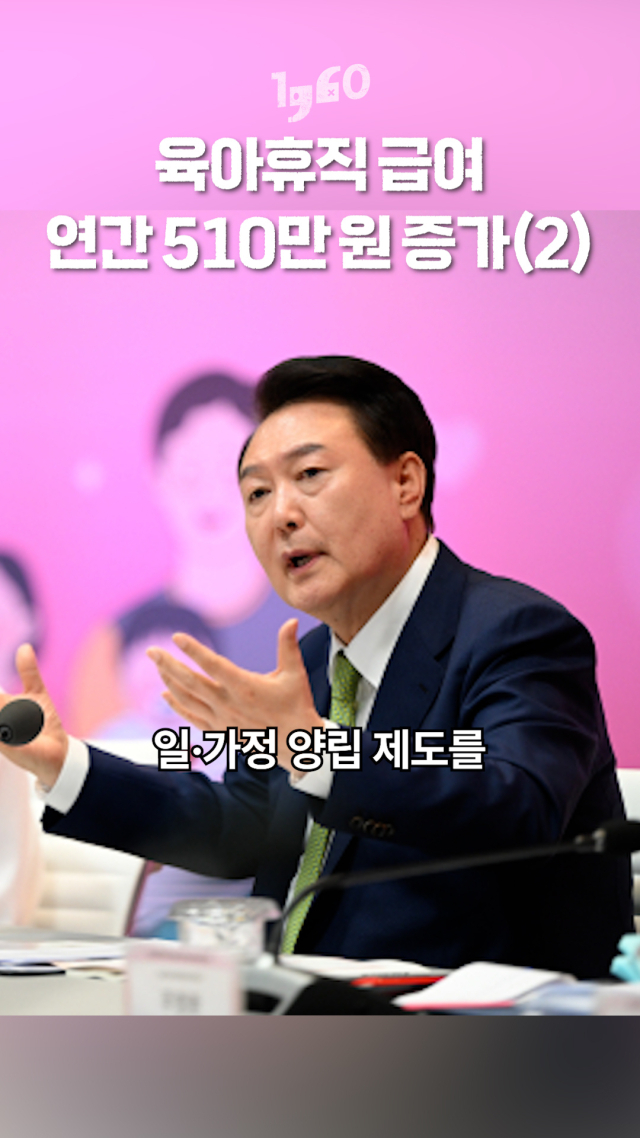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당초보다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당초 추계액의 두 배가 들어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도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특단의 재원 마련 대책과 공약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의원 특권 버리고 솔선수범 보여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박근혜식'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확보된 재원은 세출구조 조정으로 4조원, 세율 인상 없는 세원 확대로 약 1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로 대략 1조원, 합계 연 6조원 정도다. 하지만 세출구조 조정과 세율 인상 없이 세원을 확대하면 연 27조원(5년간 135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공약 실현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미뤄볼 때 당분간 2~3%의 저성장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로 보고 낙관적인 세입 예산을 편성해 복지 재원 확보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힘 있는 자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 국회의원부터 월 120만원의 의원연금, 과다한 세비와 수당, 겸직, 불체포특권 등 각종 특혜와 기득권을 내려놓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의원연금 포기, 세비 삭감 등 기득권과 특권 포기 공약이 또 공약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 홍역을 치른 지난해 12월 대선을 벌써 잊었는가.
둘째, 정부는 복지 예산이 새지 않도록 전달 체계 정비와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불용예산 처리를 위한 연말 보도블록 교체, 연초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등 낭비성 예산 집행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는 한편 인력과 조직을 효율화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셋째, 차기 정부는 공무원ㆍ군인연금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똑같은 조건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의 2~3배에 달하고 모자라는 연금을 세금으로 메우는 특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시장친화형 공기업은 민영화를 서둘러 세금에서의 지원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
넷째, 차기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원 확대에 복지 재원 확보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고소득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방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누락 세원 파악 등 가진 자의 탈세를 막아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세율인상 증세는 최후의 보루로
위의 네 가지 방안이 자리를 잡은 후 최후의 복지 재원 마련 수단으로 세율 인상에 의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 세계 수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소득세율과 글로벌 경쟁 시대에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는 어렵다. 상대적으로 낮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최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13조~15조원의 세수가 확보돼 재원 마련의 숨통이 트인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세 부담의 역진성과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앞서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대책 강구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다.
복지정책은 확보된 재원 내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복지에 충당할 재원이 없는데도 신뢰를 내세워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면 '제2의 그리스'가 될 수도 있다. 또 현세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늘린다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