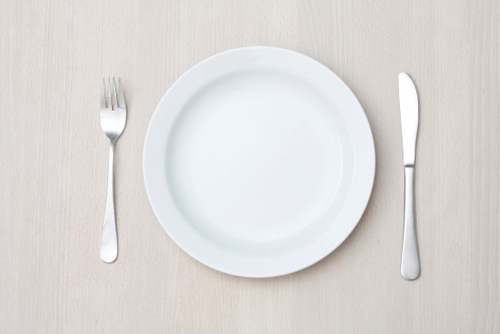|
주말에 어떤 초밥집을 갔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무제한 회전초밥집이었습니다. 대학가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 때문인지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듯한 식당이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가격과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사업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터라 기대하고 방문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통념을 이겨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음식들을 맛보니 재료의 신선도는 둘째 치고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치즈와 마요네즈와 야채, 그리고 연어가 가미된 롤을 씹자 상당히 기분 나쁜 맛이 났습니다. 음식이 부패한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일하시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음식은 재료가 신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선도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 직원은 황급히 주방으로 달려가 4~5명과 숙의를 하는 듯 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식탁으로 온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무제한 초밥집이라 일반 스시 가게처럼 신선하지 않기는 한데요. 그래도 음식 자체는 이제 막 한 것이거든요.’ 기가 막힌 답변이었습니다. 음식을 조리한 지 얼마 안됐더라도 재료는 상당히 오래된 것임에 분명한 데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장 조리했다 하더라도 그 재료가 잘못된 것이면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점을 지적하자 직원은 상당히 난감한 듯 웃으면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자신도 그 절차에 자신이 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러자 주변 시선을 의식한 듯 돈을 내지 않아도 좋으니 얼른 가시라는 시늉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불쾌함을 떨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흔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은 질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따금 자제들이 챙기는 계열사가 발주한 브랜드들은 꼼꼼한 서비스 관리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속되고 수익이 극대화될수록 회사들이 관성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기분 나쁜 음식 상태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서비스 에이전트들의 태도였습니다. 진상 고객이 아니라 문제점을 느낀 소비자가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했음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투로 얼버무리는 세태라니요.
뭔가 문제를 발견했다면 소비자는 우선 정확하게 상황을 지적해야 합니다. 재료나 그릇이나 문제가 되는 대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짚어줘야 합니다. 대화가 지속되면 제대로 된 서비스 공급자들은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주변 시선만 의식해 상황을 일단락짓고 싶은 공급자의 경우는 얼른 가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질 나쁜 음식을 제공해 놓고 표준화된 브랜드 운운하는 것 또한 고객을 상대로 한 갑질입니다. 이런 세태가 없어지려면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항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이라도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가보니 이런 문제를 제소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불량식품을 3대 악이라고 선언했던 기억이 새삼스러웠습니다.
/iluvny2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