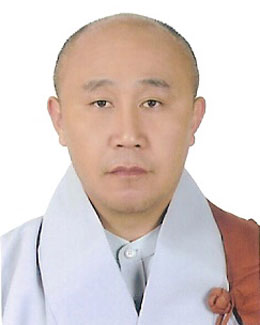여유 생겼지만 이웃 아픔 외면 <br> 지연·학연 등 차별없는 세상을
10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훗날 정각(正覺)을 이루고 부처님이 되신 싯다르타 왕자가 태어난 순간 룸비니 동산에는 온갖 꽃들이 활짝 피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려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 드렸다고 한다. 그날의 룸비니 동산처럼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이 땅에도 갖가지 꽃이 만발하고 나무와 풀들은 활력을 마음껏 뽐내며 세상 존재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해준다. 경전에서는 마야 왕비의 태에서 나온 왕자가 곧바로 사방으로 일곱 발자국을 걸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일체 중생을 모두 다 평안하게 하리라! (三界火宅 我當安之)"는 선언을 했다고 한다.
부처님은 이질에 걸려 자신의 배설물조차 처리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던 제자를 찾아가 손수 몸을 씻겨 '아픈 동료를 돌보아주는 것이 곧 나, 여래를 돌보는 것'임을 일깨워주셨고 시력을 잃어 힘들게 지내는 제자를 위해서는 직접 바늘과 실을 들어 가사를 꿰매줬던 인간적인 분이었다. 개울에서 미역을 감으며 뛰어 놀던 어린 꼬마들이 발가벗은 채 달려와 "부처님!"하고 부르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편안하게 해줬던 분이다.
과거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던 시절 우리 불가(佛家)에서는 자신들이 굶주리는 한이 있어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절 집안의 살림살이에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되레 '부처님의 가르침과 달리 세상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높아졌다.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자성(自省)과 쇄신(刷新)을 목표로 수행ㆍ문화ㆍ생명ㆍ나눔ㆍ평화 결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짐짓 모른 체 하고 있었던 세상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자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결사는 정치권 등 불교계 밖으로 향한 요구보다는 우리 스스로 잘못 해왔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 '우리가 변화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표현됐다.
위와 같은 5대 결사의 과제는 본질적으로 특정시기 동안 잠시 빛을 발하다가 사라질 수 없다. 또 불교도라면 언제 어디서나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갈수록 더 많은 종도들이 이 결사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조계종뿐 아니라 한국 불교계 전체의 모습이 확 바뀌게 될 것이다.
역사상 남 탓 하지 않고 우리부터 변하겠다는 의지를 단단하게 한 집단은 발전했지만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려온 조직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우리 종단이 자성과 쇄신을 목표로 펼치는 새로운 결사는 '여기서 주저앉고 말 것이냐, 발전과 중흥을 이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락을 줄 것이냐'는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 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사상과 신앙의 틀을 깨고 중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다. "세상의 여러 강들이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오직 한 가지 이름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신분 출신이라도 승가에 들어오면 다 똑같은 출가사문"이라며 잘못된 차별의식을 일깨워줬다.
오늘날 부처님 탄생의 의미는 우리 모두 부처님이 일러준 길을 따라 이제 더 이상 출신 지역, 학교,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그 '다름'이 오히려 축복임을 확인하며 내 이웃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고 서로 복을 나누는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