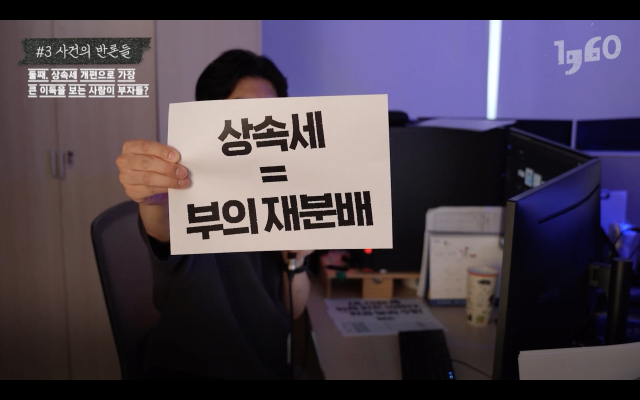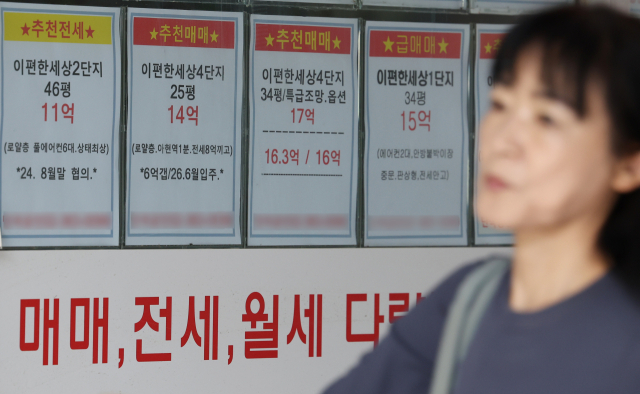홈
국제
국제일반
반짝이는 유리구슬에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입력2011.09.06 17:40:26
수정
2011.09.06 17:40:26
오토니엘 개인전, 삼성미술관 플라토서<br>유황으로 만든 '소원을 비는 벽'도 전시
 | | 장-미셀 오토니엘의 개인전이 열리는 삼성미술관 플라토의 전시전경. |
|
프랑스 파리의 명소인 루브르박물관 지하철역 입구에는 눈길을 끄는 조형작품이 있다. 유리 구슬을 줄줄이 엮어 덮개모양으로 만든 왕관 형상의 설치작품으로 제목은 '야행자들의 키오스크'. 지하철역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이 오색찬란한 구슬 곁으로, 그리고 아래로 지나가야 한다. 햇빛이 달라질 때마다 반짝임이 변하는 이 작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가 장-미셀 오토니엘(47)이 2000년에 만든 것이다.
그의 개인전 '마이웨이(My Way)'가 태평로 소재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8일부터 열린다. 올해 3월 프랑스 퐁피두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던 그의 개인전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세계 순회전의 첫 번째다. 이번 전시 이후 내년 초에는 도쿄의 하라현대미술관, 여름에는 뉴 브루클린미술관으로 순회할 예정이다.
플라토 전시장에 들어서면 육중한 형태로 눈길을 끄는 동시에 매캐한 냄새로 코를 자극하는 작품과 마주하게 된다. 1995년 베를린에서 처음 전시됐던 '소원을 비는 벽'이다. 매끈하고 검붉은 이 벽은 인화물질인 인(燐)으로 온통 뒤덮였다. 바로 옆에 성냥개비가 함께 비치돼 있다. 관람객은 성냥개비를 집어들고 벽 표면을 긁어 불을 붙인 다음, 불이 켜져 있는 동안 소원을 빌 수 있다. 성냥개비는 바닥에 그냥 버리면 된다.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수북이 쌓이는 성냥개비와 벽면 곳곳의 '긁힌' 상처는 작가와 관객이 함께 만들어간 '치유의 과정'으로 남게 된다. 미술관 측은 한 번에 5 명까지만 불을 켤 수 있도록 관람을 제한한다.
오토니엘은 1990년대 이후 강인함과 연약함을 겸비한 유리의 예술적 가능성을 발견했다. 작은 장식품을 만들던 유리를 소재로 건축적 규모의 기념비적인 대형 작품을 만들어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 유리구슬의 아름다움과 대중적 인기 때문에 상업적 작가로 폄하되는 면도 있으나 진지한 주제의식으로 보는 이들에게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다. 에이즈로 사망한 동료작가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를 추모하는 프로젝트 작품 '상처-목걸이'를 비롯해 구슬목걸이의 추상성에서 숨은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최근작 '라캉의 매듭'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다. 2002년 프랑스 카르티에재단 개인전에서 첫 선을 보인 '나의 침대'는 현란한 색채 유리구슬과 은제 레이스 고리로 만들어져 앞서 소개한 루브르 지하철역의 작품과 더불어 '친밀함'을 주제로 상상력을 자극한다.
프랑스 생테티엔에서 태어난 오토니엘은 주류 미술사조와 거리를 둔 채 개인적인 삶이 반영된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추구해 왔다. 그는 상실과 소멸을 애도하는 예민한 감성으로 유황, 밀랍, 유리 등 변형되는 재료를 통해 아름다움과 혐오감의 양면을 동시에 드러내는 작업을 추구해오고 있다. 전시는 11월27일까지. (02)2259-7781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