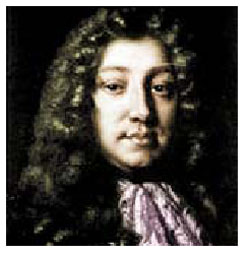|
애덤 스미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 영국 경제사가들은 이 사람을 꼽는다. 더들리 노스(Dudley North). 존 로크, 윌리엄 페티와 더불어 17세기 영국 경제학을 다진 인물이다. 1641년 5월10일, 귀족가문의 14남매 중 4남으로 태어난 노스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일찌감치 상업에 눈뜨고 바다로 나갔다. 유년기에 유랑민족인 집시족에 납치됐다 풀려난 경험이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그보다 82년 늦게 태어난 스미스 역시 집시족에 의한 유괴 경험을 겪었다는 점이 기묘하다. 노스가 무역업에 뛰어든 것은 17세 무렵. 영국의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던 레반트회사에 들어가 비잔틴 제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영국산 모직과 철을 콘스탄티노플에서 향료ㆍ포도주ㆍ면화ㆍ건포도와 교환하는 무역업으로 30세 초반 거상의 반열에 올랐다. 39세인 1680년 런던에 정착한 그는 정치권과 학계에 포진한 형제들의 도움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런던시 치안관, 하원의원, 관세청장, 재무장관을 지내는 동안 노스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정책을 펼쳤다. 은화의 모서리를 깎아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전 모서리에 톱니바퀴를 입히는 작업도 이끌었다. 최대 역작은 사망(60세) 직전에 펴낸 ‘무역론’. 완전한 자유무역, 정부의 불간섭을 주장하면서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강조한 무역론은 국부론이 나오기 전까지 최고의 경제서로 손꼽혔다. 마르크스도 그를 즐겨 인용했다. 영국이 급성장하던 시절, 노스의 주장은 부와 성장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하고 경제학이 학문으로 자리잡는 데 씨앗을 뿌렸다. 요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대목도 많지만 그는 ‘원조 시장주의자’로 기억된다. 대처리즘의 뿌리를 노스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