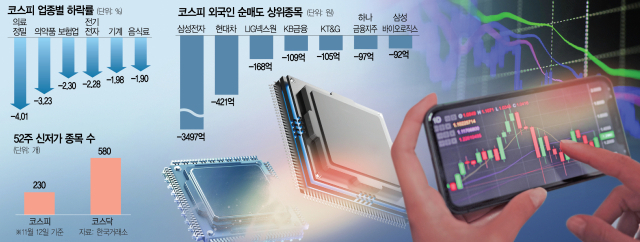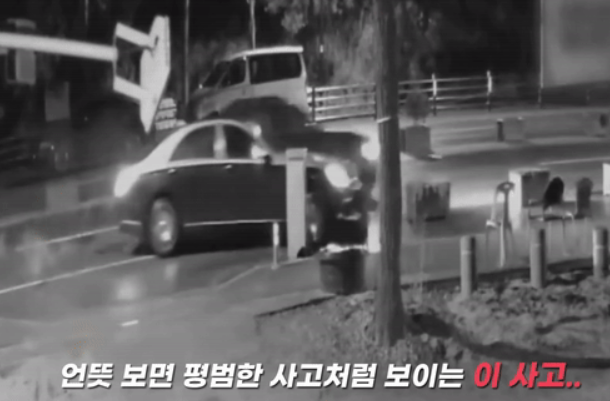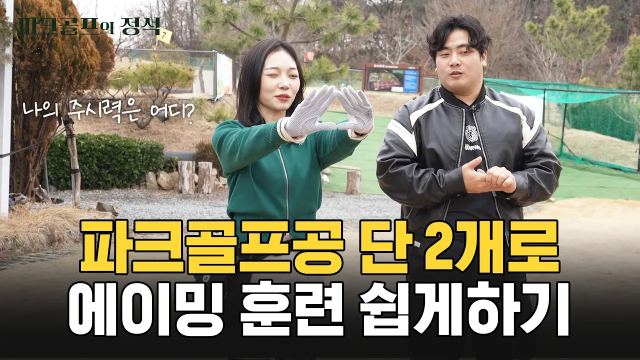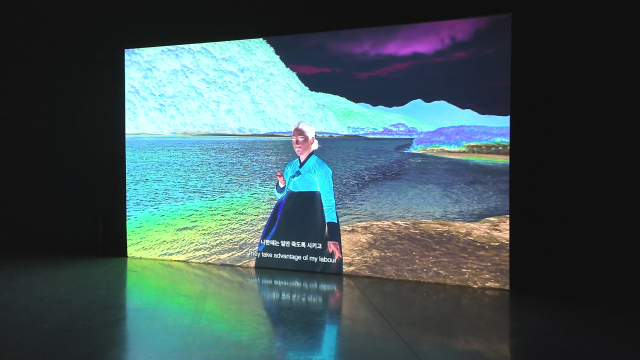주류 운동권 출신인 이철상(39) 사장이 1997년 9월 설립한 VK는 2001년 휴대전화 배터리를 생산하는 전지업체에서 휴대전화업체로 변신하면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일약 휴대전화업계의 기린아로 부상한 기업이다.
2002년 중국의 휴대전화 업체 `차브리지(Chabridge)'를 인수하면서 국내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 GSM(유럽통화방식) 휴대전화를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기 시작해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무렵 회사 이름을 VK로 바꿨고 이듬해 말에는 여세를 몰아 CDMA 방식 휴대전화를 선보이며 내수시장에도 진출했다. 텔슨전자, 세원텔레콤, 맥슨텔레콤 등이 쓰러졌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아 중견 휴대전화 업계의 `마지막 보루'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자체 브랜드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저가폰에 집중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2004년에는 매출 3천800억원, 영업이익 230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일궈냈지만매출 4천억원 고지를 앞둔 지난해부터 시련이 시작됐다.
중국 시장은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돼 더 이상 이익을 남기기가 어렵게 됐다. 뒤늦게 유럽 등으로 시장다변화에 나섰지만 노키아와 모토로라 등 글로벌 업체의 저가공세에 휘둘려 돌파구를 찾는데 실패했다. 여기에다 원화강세와 내수시장 부진이 겹쳐 유동성 위기가 심화했다.
VK는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던 지난해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해 두께 8.8㎜의 초슬림폰을 출시하고, 100억여원을 들여 프랑스 정보통신업체 웨이브컴의 GSM칩 개발부문을 인수하는 등 정면돌파를 시도했지만 영업손실 58억원, 순손실 649억원이라는 큰 적자를 냈다.
올해에도 자금난이 가중되자 이철상 사장은 지난 3월에는 SK텔레콤으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한 데 이어 지난달 8일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118억5천만원을 조달하는 등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지만 유상증자를 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3차례 1차 부도를 냈고 마침내 채권단의 처분에 회사의 운명을 맡기게 됐다.
지난 4월에는 850여명의 국내 직원을 600여명으로 줄이고 중국 공장의 직원 2천명 가운데 1천명을 내보내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실기했다는 지적이다.
VK는 모토로라와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의 대규모 납품 및 투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