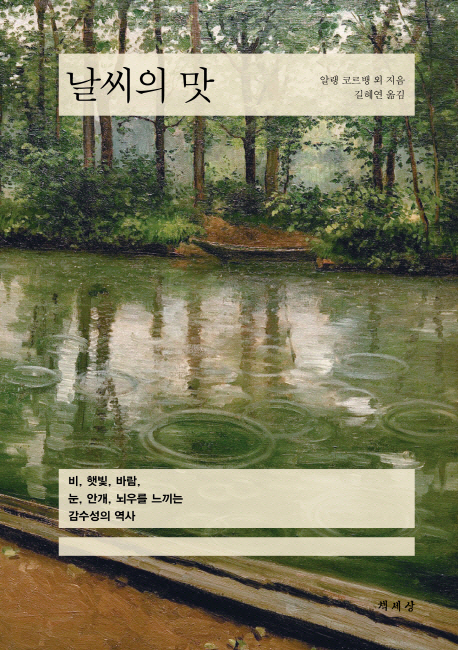‘봄이라 첫사랑이 생각난다’, ‘봄이라 노곤하다’, ‘봄이라 여행을 떠나야겠다’….
기후 변화에 따른 몸의 반응이고 정서적 변화라고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 왜 날씨를 이유로 휘둘리기 시작했단 말인가.
햇빛 좋은 날 야외활동을 하고 일광욕을 즐기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의 영향으로 햇볕을 지나치게 쬐는 것은 몸에 해롭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계몽주의 과학의 시대인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화학의 발전으로 햇빛의 인체 효용성이 입증됐다. 햇빛이 경계, 혐오, 나아가 질식사까지 우려하는 공포의 대상에서 풍요, 생명력, 창의력의 원천인 찬양의 대상으로 바뀌기까지는 그 후로도 200년이 걸렸다. ‘채털리 부인의 사랑’의 저자 데이비드 로렌스가 1928년에 출간한 ‘태양’이라는 단편에는 의사의 권고를 받아 햇빛 아래 벌거벗은 몸을 내맡긴 여주인공이 따뜻한 행복감 속에 열정적이고 야생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선탠으로 그을린 구릿빛 피부가 그 사람의 건강과 취향은 물론 경제적 지위까지도 보여주게 됐다.
자연과학의 측면에서 대기현상으로 연구됐던 날씨와는 다르게, 이 책은 그것을 느끼는 인간의 감각과 감수성에 초점을 맞춰 사회학적, 심리학적 연구로 날씨에 접근했다. 역사, 문학, 지리학, 민족학 등을 아우르는 집필진은 프랑스의 인문학 교수들이다. 목차는 △비 △햇빛 △바람 △눈 △안개 △뇌우 △일기예보로 간명하게 나뉘었다.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은 “영원히 내릴 것처럼 계속되는 질척하고 고약하고 밉살스러운 비”를 보며 투덜댄 반면 17세기의 서간문 작가 드 셰비네 부인은 빗속을 달리며 당대 여성에게 요구되던 정숙함에서 벗어나는 일탈의 기쁨을 맛봤다. 비는 감성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유용했다. 1830년부터 1848년까지 프랑스를 통치하며 ‘시민왕’을 자처했던 루이 필리프 1세는 1831년 도열한 병사들이 비를 맞고 있자 망토를 벗어던지며 함께 비를 맞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모든 프랑스 국민이 비 앞에, 즉 자연의 법칙 앞에 평등”하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고 왕의 인기는 급상승했다. 우리나라도 오랜 가뭄의 원인을 군주의 부덕함 때문이라 자책하며 조선의 왕이 직접 기우제를 지내던 풍습이 있었다.
‘안개’의 경우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예측불허의 특성 때문에 불안을 일으키지만 상상력과 창의력의 근원이 됐으며 특유의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효과로 문학과 예술 분야의 창작 원동력이 됐다. 신(神)의 분노로 여겨지던 뇌우도 오랫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독일 낭만주의에서는 ‘질풍노도 운동’으로, 프랑스 대혁명기에는 사회적 격변의 은유로 쓰이기도 했다.
한때 ‘땡전뉴스’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던 무소불위의 대통령도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일기예보’는 흔들림 없이 뉴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날씨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와 채널도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날씨 관련 어플도 수십 종이다. 날씨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 크다. 롤랑 바르트가 말한 “날씨만큼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없다”는 말의 울림이 큰 이유다. 1만6,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