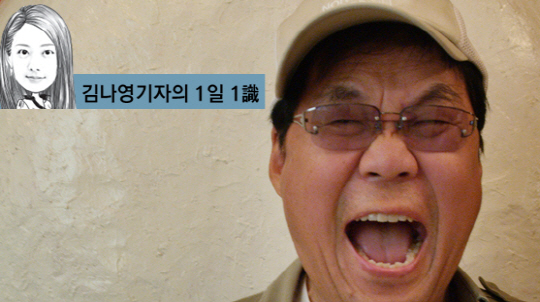가수 조영남이 단단히 걸렸다. 지난 수 년간 그려 왔던 작품들이 ‘진짜 조영남’ 그림이 아니라는 누군가의 고백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8년 동안 조영남 그림의 대부분을 소화했다고 스스로를 소개한 대리작가 송씨는 “일단 조 씨가 큰 구상을 전달하면, 자기가 완성하는 식으로 일을 했다”고 전했다. ‘90%는 대리 작가가 그리고, 10% 정도의 덧칠과 사인이 이루어진 다음 완전히 조영남 작품으로 탈바꿈하여 세상에 나간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일단 누구의 이름으로 발표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무명의 대리작가는 “조영남에게 10~20만원의 알바비를 받았고, 조영남은 그렇게 완성된 작품을 약간의 가필만 더해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의 가격을 받고 팔았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조영남에게 경위를 물었으나, 그는 ‘보조 작가들이 예술가의 지시를 받아 일종의 복제품을 만드는 행위는 예술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말했다. 업계 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의 작품활동이고, 300점 이상을 그려줬다는 주장도 과장된 부분이 많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씨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유명한 현대 미술 작가인 앤디 워홀은 자신의 제자들을 조수로 두고 사실상 기업형 창작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대 미술이라는 장르의 규정에 걸맞게 생산 방식도 현대화한 것이다. 워홀의 시도에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제기했지만, 그의 접근은 작품을 만드는 행위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송씨의 말대로라면 조영남과 워홀의 작업 방식은 닮은 점을 찾기 힘들다. 워홀 본인은 평소 작품세계를 자신이 양성하는 조수들과 꾸준히 공유했다. 다시 말해 ‘디자이너’이자 ‘기획자’로서 충분히 아이디어의 원조로서 지분을 가졌다는 의미다. 그리고 조수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구조가 현대 미술 작품의 생산 과정으로서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졌고 여러 작가들이 워홀의 대량 생산 방식을 받아들였다. 송씨의 말대로라면 조영남은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어설프게 대리작가와 거래를 시도했을 수 있다. 또 작가로서 제대로 검증받고 세계관과 철학을 구축했다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힘을 빌렸다고 한다면 뭇 사람들의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몇 십 년에 걸쳐 훈련하고 구축한 예술세계의 행태와 구조를 ‘나 역시 따라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루이스 올덴버그라는 작가의 에피소드도 마찬가지다. 청계천 다슬기 형상인 그의 작품 ‘스프링’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작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할 여력이 없을 만큼 고령이었다. 그래서 올덴버그의 제자가 현장을 방문해 작품을 설치했다. 그렇다면 그 설치물은 온전히 올덴버그의 것이라고 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작가는 자신의 구상이 지니는 고유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스케치를 제자에게 제공했다. 그리고 분명한 설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경제적 보상도 물론 납득할만 했다. 조수의 노력과 고민이 들어간 노동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지급했다. 사회적 성과도 있다. 올덴버그의 제자였다는 사실로 인해 예술계에서 통용되는 명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일 것이다. 반면에 조영남은 자신의 대리작가에게 이러한 요소들을 명확히 보장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의 대리작가는 배워야 할 조수가 아니라 ‘땜빵’을 도와주는 말 그대로 알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힘을 활용한 ‘기업형 창작’과 원조를 가장한 ‘사기’는 이런 미묘한 차이로 길이 갈린다. 조영남의 대리 작가라고 주장하는 송씨는 작품당 몇 백만원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는 상대를 보고 아니꼽고 분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가 대가 놀음하고 있는 무대 뒤에서 착취를 당하느니 솔직하게 고발하는 게 외려 남는 장사라고 봤을 법도 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작업소를 차려놓고 제자들에게 영을 하달하는 식의 미술 창작에 엄단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 예술계와 우리 예술계가 좀 정서가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 유교 사회의 규범으로 인해 선생이 제자의 것을 좀 훔쳐도 된다는 논리가 정당화되고 있는 게 한국 예술계와 학계다. 게다가 요즘 숱한 교수들의 표절, 대리 집필 스캔들이 터지고 있지 않나.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아티스트로, 지식인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조영남은 “미국에 머물던 시절 송씨를 만났는데 당시 일감이 없던 그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밑그림에 덧칠을 하는 일을 맡겼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작품 대작을 시킨 것이 결코 아니며 오리지널을 촬영해 송씨에게 보내주면 똑같이 카피해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씨의 말대로 샘플을 복제하는 역할만 맡겼다면 그는 지금 정말 억울할 것이다.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빌미로 화풀이의 대상이 되고만 셈이니까.
조영남의 대작 의혹은 진심 어린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마무리 될 것인가 아니면 유명인에 대한 음해성 해프닝으로 귀결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