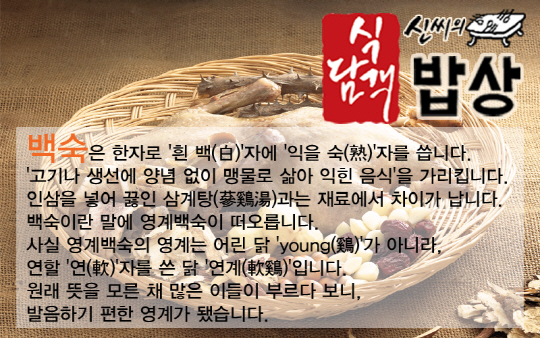어릴 적 내가 살던 마을은 주로 읍·면·리 단위에 있었습니다.
마당과 텃밭이 있는 시골집에선 동물들을 키웠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부터, 닭, 토끼, 염소, 돼지에 송아지까지도 같이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여름방학, 몇 해 동안 도시에 살던 우리 가족은 갑자기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제대로 된 작별인사도 하지 못하고 형제 같던 친구 국태·종헌이와 헤어져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나마 집안의 동물들이 외롭던 소년에게 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소년기 사내 녀석이란 호기심이 강한 법입니다.
강아지 ‘멍구’와 고양이 ‘아나’를 종이상자 안에 함께 넣고 괴수대전을 기대했습니다.
뜻밖에 밥도 사이 좋게 먹고 서로 보듬으며 자는 모습에, 한동안 어리둥절했습니다.
‘대체 왜 안 싸우지?’
토끼가 우는 소리를 들어보려고도 했습니다.
왼손으로 토식이 귀를 잡고, 오른손으로 리코더를 들어 귀에 대고 불었습니다.
토끼는 울지 않고, 뭐하는 짓이냐며 호되게 꾸짖는 아버지 말씀에 내가 대신 울먹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니, 짓궂게 굴었던 동물들에게 미안합니다.
특히 잊지 못할 녀석은 꼬마 오리였습니다.
시골로 이사한 지 보름 정도 지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시골 장터에서 새끼오리들을 사오셨습니다.
샛노란 솜털이 뽀송뽀송했던 녀석들이 “쌕쌕” 지저귀는 모습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집 안에 조그만 냇물이 흘렀는데, 아버지는 그곳에 미리 오리들이 살 집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꼬맹이 오리 다섯을 데려가, 냇물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뽀로록 헤엄치는 녀석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라면 먹으라는 어머니 말씀에 툇마루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안성탕면을 후다닥 해치우곤, 다시 꼬마들을 보러 오리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전히 활기차게 헤엄치는 녀석들.
“하나, 둘, 셋, 넷... 어, 형 한 마리가 없다!”
다급히 주변을 살펴보니, 냇가 한구석에 고개를 떠내려 가듯 흐느적대는 녀석이 보입니다.
꼬마는 탈진해서 물에 빠진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직 다리가 짧고 힘도 없어, 뭍에 오르지 못했나 봅니다.
알에서 깬 지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
“안 돼!”
13살 꼬마 인간에게 죽음이란 건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합니다.
서둘러 새끼오리를 건져내고, 살려낼 방법을 고민합니다.
인공호흡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리 부리에 어떻게 숨을 불어넣을지 고민입니다.
모양이 안 맞는데...
그때 헛간 옆에 있던 자전거 펌프가 눈에 띕니다.
“푸쉭~푸쉭~푸쉭~!”
공기주입구를 녀석의 부리 사이에 넣고, 숨 가쁘게 펌프질을 시작합니다.
“야, 안 살아난다. 바람이 옆으로 새서 그런가 봐!”
형이 손으로 주둥이 주변을 막았고, 나는 다시 펌프질에 열중합니다.
하지만 꼬마오리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습니다.
책장으로 달려가 백과사전을 뒤집니다.
인공호흡 시엔 공기를 14~16회 불어놓은 후, 가슴을 눌러 날숨을 쉬게 해줘야 한답니다.
형제는 다시 펌프질을 시작합니다.
“푸쉭~푸쉭~푸쉭~푸쉭, 푸쉭~푸쉭~푸쉭~푸쉭, 푸쉭~푸쉭~푸쉭~푸쉭 푸쉭~푸쉭~푸쉭~푸쉭!”
“지금이야, 눌러!”
시뻘개진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던 나는, 꼬마오리의 가슴을 힘껏 누릅니다.
“오도독!”
꼬마오리는, 그렇게 가슴뼈가 주저앉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형과 나는 얼이 빠진 얼굴로 한동안 서로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내 죄책감과 미안함, 두려움에 코끝이 시큰거리고 눈시울이 불긋하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울먹이다가 이내 펑펑 눈물을 쏟아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형이 말을 건넵니다.
“그만하면 됐다... 묻어 주자...”
어린 형제의 의욕적인 구조 활동은 ‘허망한 의료사고’로 막을 내렸습니다.
무덤가에 묘비 대신 작은 돌을 세워,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녀석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시간이 두어 달 지나, 녀석의 친구들은 알을 낳을 만큼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밥상에 백숙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아주 좋아했고 자주 먹을 기회도 없었지만, 왠지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내가 세상을 떠나보낸 꼬마오리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그릇을 외면하고 밥에 김치만 깨작거리자, 어른들께서 역정을 내십니다.
“귀한 음식 해줬더니 왜 안 먹어? 이런 거 잘 먹어야 쑥쑥 커서 어른이 되지!”
그다지 어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안 먹고 버티다간 밥그릇을 빼앗길 것 같단 위기감이 듭니다.
“자, 먹자.”
할머니가 뜯어 주신 오리고기 한 점을 입에 넣습니다.
이럴 수가... 닭고기보다 쫀득한 식감에, 풍요로운 맛이 입안에 가득합니다.
“국물도 떠먹고.”
이전에 먹었던 닭백숙과 국물의 깊이가 다릅니다.
오리가 닭보다 비싼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어느덧 다리에 날개를 뜯어먹고, 국물에 밥까지 꾹꾹 말아 한 그릇을 뚝딱 비웁니다.
꼬마 오리에 대한 소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추억도 기억 속에서 후르륵 사라지고 맙니다.
“거봐, 잘 먹으면서!”
후다닥 정신을 차리자, 이내 죄스러운 마음이 일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지금 같으면 사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냐며 스스로를 변호하겠지만, 13살 소년은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는 흔적도 찾기 힘든 꼬마오리의 무덤가 앞에서, 착잡한 마음으로 서성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는 나는 이미 나이 든 ‘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시나마 순수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입가에 빙긋 웃음이 머뭅니다.
“미안해, 새끼오리야. 미안, 오리새끼.” /식담객 analogoldman@naver.com
<식담객 신씨는?>
학창시절 개그맨과 작가를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언론 홍보에 입문, 발칙한 상상과 대담한 도전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어원 풀이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기업 알리기에 능통한 15년차 기업홍보 전문가. 한겨레신문에서 직장인 컬럼을 연재했고, 한국경제 ‘金과장 李대리’의 기획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PR 전문 매거진 ‘The PR’에서 홍보카툰 ‘ 미스터 홍키호테’의 스토리를 집필 중이며, PR 관련 강연과 기고도 진행 중이다. 저서로는 홍보 바닥에서 매운 맛을 본 이들의 이야기 ‘홍보의 辛(초록물고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