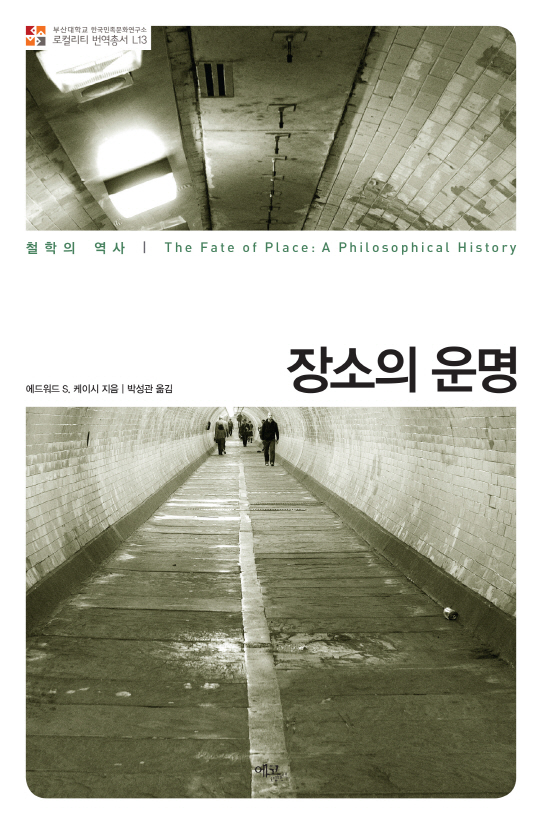“장소의 힘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그러므로 뭔가를 생각하려 할 때, 그것을 어떤 장소 내에서 생각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지금의 시대는 필경 무엇보다도 우선 공간의 시대일 것이다. 우리 시대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공간과 관련이 있다. 시간 쪽보다 훨씬 더 그러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미셸 푸코의 ‘다른 공간에 대해서’)
이렇듯 아리스토텔레스, 토머스 홉스, 미셸 푸코 등 철학자들은 ‘장소’와 그 힘의 중요성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그러나 장소는 시간중심의 사고방식 속에서 간과되거나 은폐된 측면이 상당히 많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장소는 6세기 필로포노스를 필두로 14세기 신학 그리고 17세기 자연학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공간’에 흡수됐으며,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는 시간에 종속됐다. 헤겔 이래로 마르크스, 키에르케고르, 다윈, 베르그송, 윌리엄 제임스 등에 의해 ‘시간중심주의’ 철학이 200년을 지배하는 동안엔 그 정도가 특히 심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분히 사변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어디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언제’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사유와 인식이 바로 ‘시간중심주의’라는 것이다. ‘시간’이 주가 되는 가운데 ‘장소’는 중요성도 개념도 희미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간중심주의는 모든 사물과 세계를 직선적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진화론’으로 서양 철학과 사유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관통해 왔다.
신간 ‘장소의 운명’에서 저자는 “장소의 은닉된 역사를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장소가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받아왔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책은 서구 철학의 텍스트 속에 묻혀 있는 장소의 위치를 바깥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927페이지라는 방대한 양으로 펼쳐 보여준다.
저자의 설명은 이렇다.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가 버려 유한하다. 물론 장소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만 시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유한하다. 또 우리는 어디엔가 늘 장소에 존재하며 그곳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다. 장소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는 존재할 수도 그 누구와의 관계도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시간보다 장소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과도 우리는 때론 혹은 상당 기간 다른 장소에 살면서 친밀함을 잃어간다. 이는 이웃, 친구, 동료 등 사회관계로 확장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근린관계’의 가까움은 더욱 확정되고 내밀해진다. 어떤 경험도 얼굴을 마주한 경험보다 더 친밀해질 수는 없지 않은가.
또한 저자에 따르면 장소의 중요성을 재발견한 이들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장소 자체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며 장소에는 확고불변한 본질은 없다는 확신이 깔려 있다. 하이데거 정도가 장소의 본질적 특색 즉 ‘모아들임’, ‘가깝게 함’ 등을 찾았을 뿐이다.
1,000페이지 가까이 두꺼운, 그것도 서양 철학에 대한 기본 지식까지 갖춰야 소화가 가능한 책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읽어 볼 만하다. 온라인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요즘, 우리가 타자와의 친밀함과 내밀함을 위해 ‘굳이’ 같은 장소에서 얼굴을 맞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사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만원